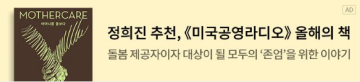GO 고
$14.04
SKU
9791185014418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Thu 04/17 - Wed 04/23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Mon 04/14 - Wed 04/16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13/11/04 |
| Pages/Weight/Size | 134*190*30mm |
| ISBN | 9791185014418 |
| Categories | 소설/시/희곡 > 스페인/중남미소설 |
Description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방황하는 청춘들을 다시 삶으로 이끌다
한국에서 이민한 작가가 자전적 요소를 바탕으로 브라질의 소울을 담아 쓴 소설이다. 청소년이 주인공도 아니고 내용도 ‘센’ 편이지만 브라질 교육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공립고등학교 필독서이다. 그러더니 브라질 청소년들이 책 제목으로 문신을 새기고 네일아트를 하며 셔츠를 만들어 입기 시작했다.
주인공이자 화자인 ‘나’는 제대로 된 직장도, 친구도, 여자친구도 없는 청년이다. 상파울루의 바 The Passenger에서 디제잉으로 생계를 꾸리며 혼자 소설을 쓰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에서 일하던 중 친구들과 놀러온 진저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진저의 소개로, 뒷골목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하는데, 이를 통해서 처음으로 삶에 보람을 느낀다. 하지만, 순간의 실수로 진저와 헤어진 후 직장도, 애인도, 친구도 다 잃은데다 가까스로 용기를 내어 찾아간 아버지에게마저 외면받는다. 나는 끝내 소설을 맺고 깨어진 삶을 완성할 수 있을까.
이 책은 방황하는 젊은 날의 초상이기도 하고, ‘나는 누구일까’를 찾아가는 서사시이기도 하며 이른바 ‘루저’의 삶을 살던 젊은이가 영웅적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자기만의 신화’이기도 하다. 우리는 누구나 한때 세상을 바꾸거나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웅이 되기를 꿈꾼다. 그러나 청춘의 꿈이 클수록 패배의 수렁 또한 깊어지는 법. 작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한다. 아무리 못난이이고 루저라도 자기 인생만큼은 지킬 수 있다고 독자의 등을 두드린다.
전형적인 ‘못난이’로 그려지는 주인공의 방황이 때로는 우습고 때로는 슬프지만,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마음에 알 수 없는 희망이 솟는다.
한국에서 이민한 작가가 자전적 요소를 바탕으로 브라질의 소울을 담아 쓴 소설이다. 청소년이 주인공도 아니고 내용도 ‘센’ 편이지만 브라질 교육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공립고등학교 필독서이다. 그러더니 브라질 청소년들이 책 제목으로 문신을 새기고 네일아트를 하며 셔츠를 만들어 입기 시작했다.
주인공이자 화자인 ‘나’는 제대로 된 직장도, 친구도, 여자친구도 없는 청년이다. 상파울루의 바 The Passenger에서 디제잉으로 생계를 꾸리며 혼자 소설을 쓰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에서 일하던 중 친구들과 놀러온 진저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진저의 소개로, 뒷골목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하는데, 이를 통해서 처음으로 삶에 보람을 느낀다. 하지만, 순간의 실수로 진저와 헤어진 후 직장도, 애인도, 친구도 다 잃은데다 가까스로 용기를 내어 찾아간 아버지에게마저 외면받는다. 나는 끝내 소설을 맺고 깨어진 삶을 완성할 수 있을까.
이 책은 방황하는 젊은 날의 초상이기도 하고, ‘나는 누구일까’를 찾아가는 서사시이기도 하며 이른바 ‘루저’의 삶을 살던 젊은이가 영웅적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자기만의 신화’이기도 하다. 우리는 누구나 한때 세상을 바꾸거나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웅이 되기를 꿈꾼다. 그러나 청춘의 꿈이 클수록 패배의 수렁 또한 깊어지는 법. 작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한다. 아무리 못난이이고 루저라도 자기 인생만큼은 지킬 수 있다고 독자의 등을 두드린다.
전형적인 ‘못난이’로 그려지는 주인공의 방황이 때로는 우습고 때로는 슬프지만,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마음에 알 수 없는 희망이 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