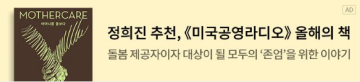봄이 들면
$17.28
SKU
9791192102276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Thu 05/8 - Wed 05/14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Mon 05/5 - Wed 05/7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24/05/07 |
| Pages/Weight/Size | 198*270*9mm |
| ISBN | 9791192102276 |
| Categories | 유아 > 4-6세 |
Description
봄을 들이는 마음이 대를 이어가는 풍경
“숲도 춥고 새도 추운 겨울 지나고
찔레나무 맹개나무 순이 돋으면
봄이 든 거다.“
눈밭에 꿩 한 쌍 서 있는 풍경이 연둣빛 돌기 시작하는 들판을 까투리 홀로 두리번거리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이 책의 도입부에 쓰인 문장입니다.?누구의 말일까요? '봄’을 주어로 했을 때 보통은 잘 쓰지 않는 ‘들다’라는 술어, 책을 두 장만 더 넘기면 “아아!”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봄 들었다는데, 언제 갈 거야? 이번에는 나도 꼭 데려가야 해!”
할머니. 봄이 무르익으면 고사리 기세 좋게 올라오는 제주의 ‘할망’이지요. 한라산, 자왈, 오름, 바당... 말만으로도 그득한 생명이 느껴지는 그 섬의 할머니이기에 봄은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물들 듯 나무에 풀꽃에 숲과 들판에 들어 속속들이 채우고 다시 배어나오는 게 아닐까요? '제주 작가’ 김영화가 지은 이 그림책 속에는 그처럼 제주에 ‘든’ 봄이 가득합니다.연둣빛, 자줏빛, 희고 노란 빛의 풀, 꽃, 나무들과 꿩이며 나비며 노루 같은 생명체들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뿜어내는 생명의 기운이 모두 봄인 것이지요.
주인공 아이와 엄마는 그 생명들 중에서도 꺾어도 꺾어도 돋아나는 ‘아홉 형제’ 고사리를 따러 한라산 자락의 들판으로 갑니다. 그리고 더 커다란 왕고사리를 찾아 수풀 속을 뒤지다가 또 다른 생명, 꿩알이 들어 있는 둥지를 만나지요. “집에 가져가서 품어 볼까? 그럼 꿩병아리가 나오나?” 아이다운 호기심에 엄마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안 돼!?만지지 마. 엄마 꿩이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알에 사람 냄새 배면 다시 품으러 안 와.” ‘제주 할망’의 따님다운 말입니다.
“숲도 춥고 새도 추운 겨울 지나고
찔레나무 맹개나무 순이 돋으면
봄이 든 거다.“
눈밭에 꿩 한 쌍 서 있는 풍경이 연둣빛 돌기 시작하는 들판을 까투리 홀로 두리번거리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이 책의 도입부에 쓰인 문장입니다.?누구의 말일까요? '봄’을 주어로 했을 때 보통은 잘 쓰지 않는 ‘들다’라는 술어, 책을 두 장만 더 넘기면 “아아!”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봄 들었다는데, 언제 갈 거야? 이번에는 나도 꼭 데려가야 해!”
할머니. 봄이 무르익으면 고사리 기세 좋게 올라오는 제주의 ‘할망’이지요. 한라산, 자왈, 오름, 바당... 말만으로도 그득한 생명이 느껴지는 그 섬의 할머니이기에 봄은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물들 듯 나무에 풀꽃에 숲과 들판에 들어 속속들이 채우고 다시 배어나오는 게 아닐까요? '제주 작가’ 김영화가 지은 이 그림책 속에는 그처럼 제주에 ‘든’ 봄이 가득합니다.연둣빛, 자줏빛, 희고 노란 빛의 풀, 꽃, 나무들과 꿩이며 나비며 노루 같은 생명체들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뿜어내는 생명의 기운이 모두 봄인 것이지요.
주인공 아이와 엄마는 그 생명들 중에서도 꺾어도 꺾어도 돋아나는 ‘아홉 형제’ 고사리를 따러 한라산 자락의 들판으로 갑니다. 그리고 더 커다란 왕고사리를 찾아 수풀 속을 뒤지다가 또 다른 생명, 꿩알이 들어 있는 둥지를 만나지요. “집에 가져가서 품어 볼까? 그럼 꿩병아리가 나오나?” 아이다운 호기심에 엄마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안 돼!?만지지 마. 엄마 꿩이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알에 사람 냄새 배면 다시 품으러 안 와.” ‘제주 할망’의 따님다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