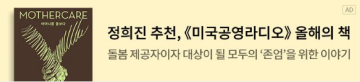돌이킬 수 없는
$12.96
SKU
9791191938593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Wed 02/12 - Tue 02/18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Fri 02/7 - Tue 02/11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24/04/30 |
| Pages/Weight/Size | 128*210*20mm |
| ISBN | 9791191938593 |
| Categories | 소설/시/희곡 > 시/희곡 |
Description
이 시집을 덮을 즈음이면 위로를 받은 사람이 되어 있다
시가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일상을 일상어로 받아 적었다. 그래도 시가 된다는 사실이 경이롭다. 시인은 시는 어렵고 지루하고 난해하다는 선입견을 불식시킨다. 분명 한 사람의 시인이 쓴 시인데, 세대를 아우르고 있다. 가난은 어느 한 시대에만 집중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가만히 짚어내고 있다. 무엇보다 가족을 바라보는 시인의 시선이 담담하다. 가족 해체, 핵가족 시대라고 해도 가족은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핏줄로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어서 또 하나의 나처럼 함께 아프고 함께 슬프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엄마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건너가는 보폭에는 너무 들뜨지도 너무 소원하지도 않은 넌짓한 크기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시인이, 길어야 백 년, 길어도 백 년인 인생을 꽉 찬 듯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사랑하며 사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다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부분에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이 시집은 쉽다. 그러나 여운이 길다.
시가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일상을 일상어로 받아 적었다. 그래도 시가 된다는 사실이 경이롭다. 시인은 시는 어렵고 지루하고 난해하다는 선입견을 불식시킨다. 분명 한 사람의 시인이 쓴 시인데, 세대를 아우르고 있다. 가난은 어느 한 시대에만 집중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가만히 짚어내고 있다. 무엇보다 가족을 바라보는 시인의 시선이 담담하다. 가족 해체, 핵가족 시대라고 해도 가족은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핏줄로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어서 또 하나의 나처럼 함께 아프고 함께 슬프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엄마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건너가는 보폭에는 너무 들뜨지도 너무 소원하지도 않은 넌짓한 크기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시인이, 길어야 백 년, 길어도 백 년인 인생을 꽉 찬 듯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사랑하며 사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다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부분에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이 시집은 쉽다. 그러나 여운이 길다.
Contents
쓰레빠 예찬
제1부
깡으로 버티다/ 타워팰리스 유감/ 대동천변에서/ 맹렬한 목숨/ 오래된 습성/ 염천/ 슬픈 속도/ 가난해도 싸다/ 파시/ 후조/ 나도 먹고 싶지 않은 밥이 있다/ 주홍글씨/ 놀라운 일/ 아내, 내 안의 사람/ 날맹이집/ 버거킹/ 수인(囚人)의 노래
제2부
어떤 죗값/ 사랑밖에 몰라/ 가족의 맛/ 금강 변에서/ 성주/ 연어/ 물컹한 침묵/ 단대목 특수/ 치우는 일/ 이제 와 하는 반성/ 옥분이 오빠네 집/ 참 무던하신 양반/ 장마/ 그늘/ 무게/ 모과/ 내가 이래도 되나 하고/ 남대천
제3부
순장/ 가로등 불빛이 창으로 걸어들어와 달빛행세를 하는 밤에/ 서울 아리랑/ 임계에서/ 해질녘/ 소곡/ 오후/ 메아리는 절망이다/ 나도 겁쟁이다/ 대화의 정석/ 긴 것은 징그럽다/ 순록의 눈물/ 흰 똥/ 바구미들/ 엄숙한 보행
제4부
이웃/ 천년은행나무의 말씀/ 영산/ 없어도 있는/ 밑천/ 물은 전부 다 용왕님 소관/ 오도재를 넘어/ 극치/ 개구신 지기다/ 쑥이 지천이다/ 문자를 받다/ 돌이킬 수 없는/ 무덤/ 부드러운 단면/ 시절 인연
[인터뷰] 시에 대한 일관된 열정과 자긍심
제1부
깡으로 버티다/ 타워팰리스 유감/ 대동천변에서/ 맹렬한 목숨/ 오래된 습성/ 염천/ 슬픈 속도/ 가난해도 싸다/ 파시/ 후조/ 나도 먹고 싶지 않은 밥이 있다/ 주홍글씨/ 놀라운 일/ 아내, 내 안의 사람/ 날맹이집/ 버거킹/ 수인(囚人)의 노래
제2부
어떤 죗값/ 사랑밖에 몰라/ 가족의 맛/ 금강 변에서/ 성주/ 연어/ 물컹한 침묵/ 단대목 특수/ 치우는 일/ 이제 와 하는 반성/ 옥분이 오빠네 집/ 참 무던하신 양반/ 장마/ 그늘/ 무게/ 모과/ 내가 이래도 되나 하고/ 남대천
제3부
순장/ 가로등 불빛이 창으로 걸어들어와 달빛행세를 하는 밤에/ 서울 아리랑/ 임계에서/ 해질녘/ 소곡/ 오후/ 메아리는 절망이다/ 나도 겁쟁이다/ 대화의 정석/ 긴 것은 징그럽다/ 순록의 눈물/ 흰 똥/ 바구미들/ 엄숙한 보행
제4부
이웃/ 천년은행나무의 말씀/ 영산/ 없어도 있는/ 밑천/ 물은 전부 다 용왕님 소관/ 오도재를 넘어/ 극치/ 개구신 지기다/ 쑥이 지천이다/ 문자를 받다/ 돌이킬 수 없는/ 무덤/ 부드러운 단면/ 시절 인연
[인터뷰] 시에 대한 일관된 열정과 자긍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