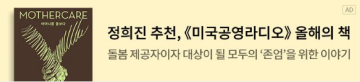그림자 없이 빛을 보다
‘모른 체하기’와 개입의 존재론
$17.28
SKU
9791169091237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05/2 - Thu 05/8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04/29 - Thu 05/1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23/07/07 |
| Pages/Weight/Size | 135*200*20mm |
| ISBN | 9791169091237 |
| Categories | 인문 > 철학/사상 |
Description
“네게서 나온 것이 네게로 돌아간다”
꿈, 종교 체험, 시詩, 심리, 지혜
그리고 철학을 거쳐 딛는 끝이자 새로운 시작
이 책에는 ‘경행’ ‘호흡’ ‘꿈(예지몽)’ ‘무의식’ 등의 개념이 자주 나온다. 이것을 학문의 범주에서 논할 수 있을까? 그동안 인문학의 새로운 길을 내고자 머리로 익힌 것을 몸으로 새기고 삶에 자리잡도록 부단히 힘써온 저자는 『그림자 없이 빛을 보다』로 ‘앎-삶’을 한번 매듭짓고 새 걸음을 내딛으려 한다. 즉 제도권 대학이 놓치고 수행자들이 풀지 못한 인간의 이치를 밝히고자 한다. 새로운 인식의 획득에만 기댄다면 깨우침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무의식의 기원’으로부터 실험해보며 새로운 실천에 진입해볼 것을 권한다.
여기 실린 글들은 언뜻 낯설고, 그로부터 펼쳐지는 이치는 잡힐 듯 잡히지 않는다. 그것은 지식이 아직 몸과 삶에 뿌리내리지 못했거나, 개인의 기질상 인식론의 범주를 넘어서는 앎을 경원시하거나, 혹은 수행하면서 안이하게 내재화하는 우를 범하는 등 다들 자기 ‘그림자’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저자는 체계 바깥으로 밀려난 지혜들을 끊임없이 캐어 올린다. 이로써 인지人智의 총체적인 확장과 심화를 시도한다.
이 글들의 논의는 쉽사리 사담이나 비학문적인 것으로 치부될 만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 학문은 이른바 ‘애매한 텍스트’에 대한 논의를 삼갔다. 하지만 불교적 지혜나 양자물리학, 정신분석학 등이 기존 인식론의 범위를 넘나들듯이 저자는 스스로 일궈온 개념인 ‘알면서 모른 체하기’ ‘자기 개입’ 등을 통해 앎-삶의 차원을 더 확장하고자 한다. 이 영역은 객관성과 주관성이 하나 되며, 호흡이 몸과 마음을 매개하고, 느낌이 몸과 마음의 매개적 연합체라는 이치와도 빼닮았다. 저자는 학學과 술術, 철학과 종교, 유물과 유심, 주체와 객체, 정신과 자연을 통섭하는(불이不二) 좁은 공부길을 열기 위해 이런 논의를 펼친다.
이 같은 공부는 실재들 사이를 잇는 접면interfaces에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이런 이치들은 말끔히 해명되지 않는데, 저자는 이들을 끌어안는 글쓰기가 위험을 내포하면서도 강력한 창의성을 일군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인간은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 에둘러 통과하려 노력하거나, 그만두거나. 바꿔 말해 현명해지거나 어리석어지는 갈림길이다.
이로써 얻게 되는 깨우침은 무엇일까? ‘깨우친다’는 것은 우선 사무친다는 뜻이다. 사무친다는 것은 깊이 스며든다는 것으로, 이것은 인식론적 차원을 넘는다(왜냐하면 인식론의 안팎을 오가는 표상들은 대개 사무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깨우침은 내용중심적이거나 인식의 협궤 속으로 구겨져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며, 머리·몸으로 체득한 뒤 의욕으로써 살아내야 한다. 이해, 체득, 의욕은 사람마다 다른데, 의욕이 하얗게 되는 자리를 확보한 이들이 바로 우리가 성인이라 일컫는 공자나 소크라테스다.
저자는 실천의 방식으로 알면서 모른 체하기와 자기 개입 등을 말한다. ‘알면서 모른 체하기’는 나를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윽고 나를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 때 생겨나는 가능성이다. ‘자기 개입’이란, 인간의 존재는 이미/늘 타자와 연루해 있다는 사실이며, 이 사실에 대한 에고론적 무명無明이고, 그래서 매사 타자에 현명하고 관후하게 응하려는 윤리를 말한다.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다가 마당으로 나와 타자와 대면하자마자 나둥그러지는 사람은 아직 공부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이다. 반면 응하기에 성공한다면 그 자리에 아름다움이 지필 것이다. 타자에 응해 개입하면서 우리 각자는 자신의 윤리적 차원을 얻는다.
무의식보다 의식적인 것에 기대어 살아가는 인간들은 모든 일에 해석을 가한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성취이자 ‘그림자’라고 저자는 말한다. 하지만 의식 너머 실재의 총체성을 파악하는 데 그 그림자는 계속 따라붙어 시야를 환히 열지 못하게 한다. 마치 플라톤의 동굴 속 존재들처럼. 이 책의 제목은 ‘그림자 없이 빛을 보다’이다. 과연 제목처럼 우리는 그림자 없이 빛을 볼 수 있을까. 그것은 ‘나보다 더 큰 나’의 가능성을 어떻게 열어줄 것인가.
꿈, 종교 체험, 시詩, 심리, 지혜
그리고 철학을 거쳐 딛는 끝이자 새로운 시작
이 책에는 ‘경행’ ‘호흡’ ‘꿈(예지몽)’ ‘무의식’ 등의 개념이 자주 나온다. 이것을 학문의 범주에서 논할 수 있을까? 그동안 인문학의 새로운 길을 내고자 머리로 익힌 것을 몸으로 새기고 삶에 자리잡도록 부단히 힘써온 저자는 『그림자 없이 빛을 보다』로 ‘앎-삶’을 한번 매듭짓고 새 걸음을 내딛으려 한다. 즉 제도권 대학이 놓치고 수행자들이 풀지 못한 인간의 이치를 밝히고자 한다. 새로운 인식의 획득에만 기댄다면 깨우침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무의식의 기원’으로부터 실험해보며 새로운 실천에 진입해볼 것을 권한다.
여기 실린 글들은 언뜻 낯설고, 그로부터 펼쳐지는 이치는 잡힐 듯 잡히지 않는다. 그것은 지식이 아직 몸과 삶에 뿌리내리지 못했거나, 개인의 기질상 인식론의 범주를 넘어서는 앎을 경원시하거나, 혹은 수행하면서 안이하게 내재화하는 우를 범하는 등 다들 자기 ‘그림자’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저자는 체계 바깥으로 밀려난 지혜들을 끊임없이 캐어 올린다. 이로써 인지人智의 총체적인 확장과 심화를 시도한다.
이 글들의 논의는 쉽사리 사담이나 비학문적인 것으로 치부될 만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 학문은 이른바 ‘애매한 텍스트’에 대한 논의를 삼갔다. 하지만 불교적 지혜나 양자물리학, 정신분석학 등이 기존 인식론의 범위를 넘나들듯이 저자는 스스로 일궈온 개념인 ‘알면서 모른 체하기’ ‘자기 개입’ 등을 통해 앎-삶의 차원을 더 확장하고자 한다. 이 영역은 객관성과 주관성이 하나 되며, 호흡이 몸과 마음을 매개하고, 느낌이 몸과 마음의 매개적 연합체라는 이치와도 빼닮았다. 저자는 학學과 술術, 철학과 종교, 유물과 유심, 주체와 객체, 정신과 자연을 통섭하는(불이不二) 좁은 공부길을 열기 위해 이런 논의를 펼친다.
이 같은 공부는 실재들 사이를 잇는 접면interfaces에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이런 이치들은 말끔히 해명되지 않는데, 저자는 이들을 끌어안는 글쓰기가 위험을 내포하면서도 강력한 창의성을 일군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인간은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 에둘러 통과하려 노력하거나, 그만두거나. 바꿔 말해 현명해지거나 어리석어지는 갈림길이다.
이로써 얻게 되는 깨우침은 무엇일까? ‘깨우친다’는 것은 우선 사무친다는 뜻이다. 사무친다는 것은 깊이 스며든다는 것으로, 이것은 인식론적 차원을 넘는다(왜냐하면 인식론의 안팎을 오가는 표상들은 대개 사무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깨우침은 내용중심적이거나 인식의 협궤 속으로 구겨져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며, 머리·몸으로 체득한 뒤 의욕으로써 살아내야 한다. 이해, 체득, 의욕은 사람마다 다른데, 의욕이 하얗게 되는 자리를 확보한 이들이 바로 우리가 성인이라 일컫는 공자나 소크라테스다.
저자는 실천의 방식으로 알면서 모른 체하기와 자기 개입 등을 말한다. ‘알면서 모른 체하기’는 나를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윽고 나를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 때 생겨나는 가능성이다. ‘자기 개입’이란, 인간의 존재는 이미/늘 타자와 연루해 있다는 사실이며, 이 사실에 대한 에고론적 무명無明이고, 그래서 매사 타자에 현명하고 관후하게 응하려는 윤리를 말한다.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다가 마당으로 나와 타자와 대면하자마자 나둥그러지는 사람은 아직 공부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이다. 반면 응하기에 성공한다면 그 자리에 아름다움이 지필 것이다. 타자에 응해 개입하면서 우리 각자는 자신의 윤리적 차원을 얻는다.
무의식보다 의식적인 것에 기대어 살아가는 인간들은 모든 일에 해석을 가한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성취이자 ‘그림자’라고 저자는 말한다. 하지만 의식 너머 실재의 총체성을 파악하는 데 그 그림자는 계속 따라붙어 시야를 환히 열지 못하게 한다. 마치 플라톤의 동굴 속 존재들처럼. 이 책의 제목은 ‘그림자 없이 빛을 보다’이다. 과연 제목처럼 우리는 그림자 없이 빛을 볼 수 있을까. 그것은 ‘나보다 더 큰 나’의 가능성을 어떻게 열어줄 것인가.
Contents
서문_한 끝
1장 무의식의 기원에서 정신을 보다
나의 경행법│신독과 경행 그리고 장소화│몸, 무의식 그리고 기계: 주체화의 다른 길들│자유, 혹은 금지禁止의 형식이 개창한 것│자유의 비밀│‘마침내果’│선繕이다│알면서 모른 체하기 1: 동시긍정의 길│무의식의 기원에서 정신을 보다│하카라이가 없애려는 게 곧 하카라이이므로│시인들│지혜는 어디에 있는가?│동중정의 지혜│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면 거의 모든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성聖은 성좌처럼 비현실적 가상으로서 길을 밝힐 뿐이며│끝은 겉에 있는 것│심원시망 지심여환心元是妄 知心如幻│운명에 관한 다섯 가지 상식│모든 해석은 실패한다│깨침이란 무엇인가 1│깨침이란 무엇인가 2│개입과 불이 1│개입과 불이 2│툇마루에 앉아 물레를 생각한다│버지니아 울프가 말하지 않는 것│의욕이 하아얗게 되는 자리│허실인정虛室仁庭│권태로운 일에도 평심을 지키며│시작이다│낙타의 혹을 뗄 수 있느냐│오늘 아침도 인간만이 절망이지만│알면서 모른 체하기 2: 기파其派│알면서 모른 체하기 3: 마하리쉬의 경우│알면서 모른 체하기 4: 비인칭非人稱의 세계│임사 체험과 유체이탈 체험│절대지의 단상│여든하나│겨끔내기의 원리
2장 미립과 징조, 혹은 ‘알면서 모른 체하기’
내가 내 그림자를 없앤 채로는 빛을 볼 수 없다는 것│목검은 어떻게 넘어지느냐│‘모른다, 모른다, 모른다’?예지몽의 경우 1│‘지진이 끝났다’고, 지진이 ‘말’했다│꿈을 만들 듯이 현실을 만들 수 있는가│유사한 사례들, 일곱│박정희가 죽는다│관심은, 앎은, 어떻게 전해지는 것일까│젊은 네가 죽었다, 혹은 ‘전형성’이라는 개입의 흔적│개꿈의 구조│우연의 한계│애매한 텍스트들│여담 하나, ‘나도 알고 있어요. 엄마 배 속에서 다 들었어요!’│몸은 섣부른 말을 싫어한다
3장 너는 그 누구의 꿈으로 존재하는가
반딧불이는 다만 반딧불이이지만│질투, 이상한│고양이를 만나다│천혜의 것│악몽│왜 어떤 말은 사람의 영혼을 단번에 오염시키는 것일까│와일드 신드롬│성자오달│인간의 말이 아니었지만│너는 그 누구의 꿈으로 존재하는가│잘 있거라, 내 것이 아닌 것들아│시종여일법│‘되기’와 ‘생각하기’│이렇게 말했다│겨우, 곁눈질│내 인생이었던 독서│한 걸음이 탄탄할수록│죽어가는 것, 살아 있는 것│도회韜晦의 내면│설명의 영웅주의│어긋나는 세속을 지나면서도 가능한 지혜가 있다면
1장 무의식의 기원에서 정신을 보다
나의 경행법│신독과 경행 그리고 장소화│몸, 무의식 그리고 기계: 주체화의 다른 길들│자유, 혹은 금지禁止의 형식이 개창한 것│자유의 비밀│‘마침내果’│선繕이다│알면서 모른 체하기 1: 동시긍정의 길│무의식의 기원에서 정신을 보다│하카라이가 없애려는 게 곧 하카라이이므로│시인들│지혜는 어디에 있는가?│동중정의 지혜│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면 거의 모든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성聖은 성좌처럼 비현실적 가상으로서 길을 밝힐 뿐이며│끝은 겉에 있는 것│심원시망 지심여환心元是妄 知心如幻│운명에 관한 다섯 가지 상식│모든 해석은 실패한다│깨침이란 무엇인가 1│깨침이란 무엇인가 2│개입과 불이 1│개입과 불이 2│툇마루에 앉아 물레를 생각한다│버지니아 울프가 말하지 않는 것│의욕이 하아얗게 되는 자리│허실인정虛室仁庭│권태로운 일에도 평심을 지키며│시작이다│낙타의 혹을 뗄 수 있느냐│오늘 아침도 인간만이 절망이지만│알면서 모른 체하기 2: 기파其派│알면서 모른 체하기 3: 마하리쉬의 경우│알면서 모른 체하기 4: 비인칭非人稱의 세계│임사 체험과 유체이탈 체험│절대지의 단상│여든하나│겨끔내기의 원리
2장 미립과 징조, 혹은 ‘알면서 모른 체하기’
내가 내 그림자를 없앤 채로는 빛을 볼 수 없다는 것│목검은 어떻게 넘어지느냐│‘모른다, 모른다, 모른다’?예지몽의 경우 1│‘지진이 끝났다’고, 지진이 ‘말’했다│꿈을 만들 듯이 현실을 만들 수 있는가│유사한 사례들, 일곱│박정희가 죽는다│관심은, 앎은, 어떻게 전해지는 것일까│젊은 네가 죽었다, 혹은 ‘전형성’이라는 개입의 흔적│개꿈의 구조│우연의 한계│애매한 텍스트들│여담 하나, ‘나도 알고 있어요. 엄마 배 속에서 다 들었어요!’│몸은 섣부른 말을 싫어한다
3장 너는 그 누구의 꿈으로 존재하는가
반딧불이는 다만 반딧불이이지만│질투, 이상한│고양이를 만나다│천혜의 것│악몽│왜 어떤 말은 사람의 영혼을 단번에 오염시키는 것일까│와일드 신드롬│성자오달│인간의 말이 아니었지만│너는 그 누구의 꿈으로 존재하는가│잘 있거라, 내 것이 아닌 것들아│시종여일법│‘되기’와 ‘생각하기’│이렇게 말했다│겨우, 곁눈질│내 인생이었던 독서│한 걸음이 탄탄할수록│죽어가는 것, 살아 있는 것│도회韜晦의 내면│설명의 영웅주의│어긋나는 세속을 지나면서도 가능한 지혜가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