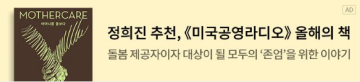태양의 변주곡
$8.64
SKU
9788998096069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Wed 04/30 - Tue 05/6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Fri 04/25 - Tue 04/29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12/10/22 |
| Pages/Weight/Size | 125*206*20mm |
| ISBN | 9788998096069 |
| Categories | 소설/시/희곡 > 시/희곡 |
Description
계간 『현대시문학』으로 등단한 신혜경 시인의 세 번째 시집이다. 시인의 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시어와 시어 사이에서, 행과 행 사이에서 묻어난다. 콘크리트와 삭막한 도시를 묘사하면서도 서정성과 시적 울림이 남아있다. '귀뚜리가 이 곳에서 울음을 울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아파트에서도 시인은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를 찾아낸다. 그러면서 시선을 귀뚜라미에서 아파트에 갇힌 이들과 나아가 어둠 속에 잠긴 도시로 옮기며 그 속에서 생명과 신선한 감각이 남아있기를 소망한다.
이처럼 시인은 낮은 곳, 자연, 근원에 대한 추구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것은 때로 주술적인 것에 대한 탐구로 이어진다. 시 「오라고만 하는 산」의 산은 '언제나 그곳에서 손짓만' 하며 그 본질이 훼손되는 일 없이 시간을 초월해 존재하고 있다. 「북소리」의 북소리 역시, '수천년을 거슬러 올라가'도 만날 수 있는 항구적인 울림이다. 이처럼 시 속에서 원형적인 숨결과 에너지를 찾으면서 시인은 독자들의 존재의 근원을 일깨운다.
이처럼 시인은 낮은 곳, 자연, 근원에 대한 추구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것은 때로 주술적인 것에 대한 탐구로 이어진다. 시 「오라고만 하는 산」의 산은 '언제나 그곳에서 손짓만' 하며 그 본질이 훼손되는 일 없이 시간을 초월해 존재하고 있다. 「북소리」의 북소리 역시, '수천년을 거슬러 올라가'도 만날 수 있는 항구적인 울림이다. 이처럼 시 속에서 원형적인 숨결과 에너지를 찾으면서 시인은 독자들의 존재의 근원을 일깨운다.
Contents
시인의 말
제1부
숙제
우포늪 겨울
북소리
만날재를 오르다
떠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깃발
그대 앉은 자리
유량민들의 합창
간혹 벽을 마주보고 주차를 한다
빵구 똥꾸야 내다
편지
아파트 벽 틈 사이 귀뚜라미 울음소리
제2부
흉몽
우리 에미는 술집 여자다
초겨울의 여윈 나무들
무심한 관계속에서
마산 앞바다
농담 같은 진담
만날재를 오르며
겨울여행
나무의 뿌리
태양의 변주곡
천주산 진달래꽃
제3부
바다는 언제나 알래스카를 향해 달린다
무학산에게 물어 본다
버린 성냥통이 왜 거기에 있었을까
고향길을 걸으며
잃어버린 것들이 말을 걸어온다
가버린 시간들은 그저 그렇게
산골마을 작은 집
홍매의 미소
비가 오는 날
봉정사 풍경
흐르는 강물처럼
제4부
사람이라면
가슴속 작은 느티나무
도시의 회색성을 띤 빌딩의 은밀한 대화
오라고만 하는 산
갈리아노와 한 송이 장미
고운 연분홍 꽃잎의 함정
우리 두 귀를 다시 달기로 했다
낱말들의 반란
무릎을 꿇고 앉는다지만
벽들과 벽들 사이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찰나
바람 부는 날이면 길을 걷는다
해설| 세상 보듬기와 근원을 향한 시선
손진은(시인, 경주대 교수)
제1부
숙제
우포늪 겨울
북소리
만날재를 오르다
떠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깃발
그대 앉은 자리
유량민들의 합창
간혹 벽을 마주보고 주차를 한다
빵구 똥꾸야 내다
편지
아파트 벽 틈 사이 귀뚜라미 울음소리
제2부
흉몽
우리 에미는 술집 여자다
초겨울의 여윈 나무들
무심한 관계속에서
마산 앞바다
농담 같은 진담
만날재를 오르며
겨울여행
나무의 뿌리
태양의 변주곡
천주산 진달래꽃
제3부
바다는 언제나 알래스카를 향해 달린다
무학산에게 물어 본다
버린 성냥통이 왜 거기에 있었을까
고향길을 걸으며
잃어버린 것들이 말을 걸어온다
가버린 시간들은 그저 그렇게
산골마을 작은 집
홍매의 미소
비가 오는 날
봉정사 풍경
흐르는 강물처럼
제4부
사람이라면
가슴속 작은 느티나무
도시의 회색성을 띤 빌딩의 은밀한 대화
오라고만 하는 산
갈리아노와 한 송이 장미
고운 연분홍 꽃잎의 함정
우리 두 귀를 다시 달기로 했다
낱말들의 반란
무릎을 꿇고 앉는다지만
벽들과 벽들 사이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찰나
바람 부는 날이면 길을 걷는다
해설| 세상 보듬기와 근원을 향한 시선
손진은(시인, 경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