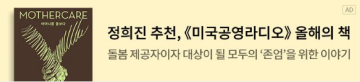슬퍼할 권리
$14.04
SKU
9788964360903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05/9 - Thu 05/15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05/6 - Thu 05/8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14/12/08 |
| Pages/Weight/Size | 153*224*17mm |
| ISBN | 978896436090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
Description
이 책이 슬픔의 박물관이길 바란다
4월 17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단어가 [합동분향소] 아닌가 싶다. 이 무슨 비극이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반복인지 모르겠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잠이 오지 않는다.”(「현실이 지옥이다」)라는 말로 세월호를 향하기 시작한 펜 끝은, 그 뒤로 구해야 할, 또 구할 수 있었던 생명들이 눈앞에서 하나둘 스러져가는 모습을 목도하며 치받는 분노와 경악, 차디찬 바다만큼이나 뼈를 시리게 하는 슬픔, 바다에 잠겨 하늘로 호명된 여린 목숨들, 그들에게 마땅히 주어졌어야 할, 그러나 빼앗겨버리고 만 삶을 들여다보는 고통을 그리게 된다.
“잊지 않겠다는 다짐은 잊혀진다는 반증이다. 잊혀질까 두려운 심정에 투여하는 각성제와 다를 바 없다. 시간 앞에 스러지지 않는 기억이 어디 있으며 망각이란 습성을 떨칠 수 있는 존재 또한 있겠는가. 인간에게 망각이란 기능이 없다면 미쳐버렸을 거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빈번했겠다. 잊히는 게 아니라 가라앉는 거다. 가라앉아도 호명하면 순식간에 전부가 떠오르는 기억일 것이다. 세월호가 우리에게 그렇다.”(5쪽)
지은이는 “정보에 접근할 기회도 자격도 없다면 천지간에 흥건한 슬픔을 기록하겠다”고 한다. 다스리면 힘이 되고 쌓이면 폭발하는 위험물질인 슬픔을 적어 내려간 이 책이 ‘슬픔의 박물관’이 되길 바란다. 이 박물관에 그려져 있는 건 커다란 배 한 척이 아니다. 마땅히 그 배에서 나와야 했던 한 사람, 그리고 숫자로 표기될 수 없는 많은 ‘한 사람’과 뭍에서 만나야 했던 가족들이 그려진다.
응어리를 들여다보는 일은 그 응어리를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반면 이 책은 다른 목적이 없는 기록이다.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목적인 기록인 것이다. 세월호 사건은 해소될 수 없는 아픔이며, 마무리 지어질 수 없는 비극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렇게 있어야 할 기록이면서, 또 세상에 없어야 할 책이기도 하다. 누군가 이런 기록을 할 만한 일이 두 번 다시 벌어져선 안 되니 말이다.
4월 17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단어가 [합동분향소] 아닌가 싶다. 이 무슨 비극이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반복인지 모르겠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잠이 오지 않는다.”(「현실이 지옥이다」)라는 말로 세월호를 향하기 시작한 펜 끝은, 그 뒤로 구해야 할, 또 구할 수 있었던 생명들이 눈앞에서 하나둘 스러져가는 모습을 목도하며 치받는 분노와 경악, 차디찬 바다만큼이나 뼈를 시리게 하는 슬픔, 바다에 잠겨 하늘로 호명된 여린 목숨들, 그들에게 마땅히 주어졌어야 할, 그러나 빼앗겨버리고 만 삶을 들여다보는 고통을 그리게 된다.
“잊지 않겠다는 다짐은 잊혀진다는 반증이다. 잊혀질까 두려운 심정에 투여하는 각성제와 다를 바 없다. 시간 앞에 스러지지 않는 기억이 어디 있으며 망각이란 습성을 떨칠 수 있는 존재 또한 있겠는가. 인간에게 망각이란 기능이 없다면 미쳐버렸을 거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빈번했겠다. 잊히는 게 아니라 가라앉는 거다. 가라앉아도 호명하면 순식간에 전부가 떠오르는 기억일 것이다. 세월호가 우리에게 그렇다.”(5쪽)
지은이는 “정보에 접근할 기회도 자격도 없다면 천지간에 흥건한 슬픔을 기록하겠다”고 한다. 다스리면 힘이 되고 쌓이면 폭발하는 위험물질인 슬픔을 적어 내려간 이 책이 ‘슬픔의 박물관’이 되길 바란다. 이 박물관에 그려져 있는 건 커다란 배 한 척이 아니다. 마땅히 그 배에서 나와야 했던 한 사람, 그리고 숫자로 표기될 수 없는 많은 ‘한 사람’과 뭍에서 만나야 했던 가족들이 그려진다.
응어리를 들여다보는 일은 그 응어리를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반면 이 책은 다른 목적이 없는 기록이다.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목적인 기록인 것이다. 세월호 사건은 해소될 수 없는 아픔이며, 마무리 지어질 수 없는 비극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렇게 있어야 할 기록이면서, 또 세상에 없어야 할 책이기도 하다. 누군가 이런 기록을 할 만한 일이 두 번 다시 벌어져선 안 되니 말이다.
Contents
서문
제1부 슬픔은 분노보다 한 걸음 늦다
제2부 참을 수 없는, 참을 이유도 없는 눈물
제3부 허락된 단 하나의 방법, 기다림
제4부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후기
제1부 슬픔은 분노보다 한 걸음 늦다
제2부 참을 수 없는, 참을 이유도 없는 눈물
제3부 허락된 단 하나의 방법, 기다림
제4부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