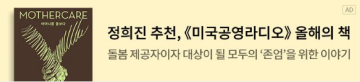이상훈의 마을숲 이야기
$21.60
SKU
9788962919851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Tue 05/6 - Mon 05/12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hu 05/1 - Mon 05/5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22/11/07 |
| Pages/Weight/Size | 152*225*16mm |
| ISBN | 978896291985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Description
전국의 마을숲을 돌아보며 저자가 건져 올린
인간과 자연이 이루어 낸 연대의 순간들!
예로부터 사람들은 마을 어귀나 강과 산이 있는 방향에 숲을 가꾸어 왔다. 계절풍 바람을 막고 홍수에 대비하여 마을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나라 마을들은 대체로 배산임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마을 앞이 텅 비어 있었다. 때문에 강이 범람하거나 겨울철 바람이 들이닥치면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 내야 했다. 어떻게 하면 마을을 지키고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당시 눈앞의 자연 외에 의지할 곳이 없었던 사람들이 떠올린 방법은 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었다. 땅의 형상과 변화를 해석하여 땅의 불안정한 지점을 메꾸고자 한 것이다. 사람들은 마을 주위에 숲을 조성하고 돌탑과 선돌을 세웠다. 그러면 땅은 화답이라도 하듯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였다. 마을에 원인 모를 전염병이 돌거나 나라가 전쟁으로 어수선할 때도 땅은 숲으로 마을을 감싸 사람들을 보호했다. 사람들은 마을을 감싸고 있는 그 숲을 ‘마을숲’이라고 불렀고, 그때부터 인간과 자연 간의 연대가 시작되었다.
인간과 자연이 이루어 낸 연대의 순간들!
예로부터 사람들은 마을 어귀나 강과 산이 있는 방향에 숲을 가꾸어 왔다. 계절풍 바람을 막고 홍수에 대비하여 마을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나라 마을들은 대체로 배산임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마을 앞이 텅 비어 있었다. 때문에 강이 범람하거나 겨울철 바람이 들이닥치면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 내야 했다. 어떻게 하면 마을을 지키고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당시 눈앞의 자연 외에 의지할 곳이 없었던 사람들이 떠올린 방법은 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었다. 땅의 형상과 변화를 해석하여 땅의 불안정한 지점을 메꾸고자 한 것이다. 사람들은 마을 주위에 숲을 조성하고 돌탑과 선돌을 세웠다. 그러면 땅은 화답이라도 하듯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였다. 마을에 원인 모를 전염병이 돌거나 나라가 전쟁으로 어수선할 때도 땅은 숲으로 마을을 감싸 사람들을 보호했다. 사람들은 마을을 감싸고 있는 그 숲을 ‘마을숲’이라고 불렀고, 그때부터 인간과 자연 간의 연대가 시작되었다.
Contents
글을 시작하며
1장. 진안의 마을숲
01 아름다운 마을숲 1번지 하초 마을숲
02 은천 마을숲과 거북이야기
03 원연장 마을숲과 마을숲 축제
04 원반월 마을숲과 마이산
05 영모정숲 이야기
06 백운 원반송과 내동마을
07 원가람 마을숲과 상수리
08 원두남·삼봉·원월평 마을숲
09 안정동 마을숲
10 염북 마을숲
11 판치·신동 마을숲
12 윤기 마을숲과 주변 마을의 모정
13 술풀
14 원동촌 마을숲
15 무거 마을숲
16 하향 마을숲
17 탄곡 마을숲
18 내오천 마을숲
19 마령초등학교 이팝나무숲
20 원단양 마을숲
21 원좌산 마을숲
22 원외궁·상외궁 마을숲
2장. 장수의 마을숲
01 양신 마을숲과 새마을운동
02 난평마을 소나무숲과 알봉 전설
03 노하 마을숲과 추억
04 원삼장 마을숲
05 월강마을 깔봉숲과 초장 마을숲
06 용계 마을숲과 장풍비보
07 원명덕·평지 마을숲
08 동촌 마을숲
09 마평 마을숲
10 동고 마을숲
11 구선동 마을숲과 돌석상
12 원송천 마을숲
13 연동마을 솔숲
3장. 임실의 마을숲
01 방동 마을숲과 방수 8경
02 물우리 마을숲
03 구담 마을숲
04 수월 마을숲
05 금평 마을숲
06 필봉 마을숲
07 양지·낙촌 마을숲
4장. 무주의 마을숲
01 왕정 마을숲과 반딧불 축제
02 주고·당저 마을숲과 동산숲
03 통안 마을숲
04 명천 마을숲
05 죽장 마을숲
5장. 완주·전주의 마을숲
01 완주 두방 마을숲과 소유권
02 완주 봉동·고산 마을숲
03 완주 화원 마을숲
04 완주 마자 마을숲
05 완주 내아 마을숲
06 전주 건지산과 용수동 왕버들
07 전주고등학교 학교숲
6장. 남원·순창·정읍·부안·고창의 마을숲
01 남원 왈길·옥전·계산 마을숲
02 남원 사곡 마을숲과 대말 방죽숲
03 남원 운봉 선두숲
04 남원 신기 마을숲
05 남원 내인 마을숲
06 순창 팔왕 마을숲과 담양 관방제림
07 정읍 공동 마을숲
08 부안 내소사 전나무숲
09 고창 삼태 마을숲
7장. 전국의 마을숲
01 금오도 해송숲과 봉산
02 해남 녹우당 해송숲
03 영광 법성진 숲쟁이
04 해남 서림
05 남해 마을숲과 마을숲 보존
06 하동 송림
07 고성 장산 마을숲
08 함양 도천 마을숲
09 통영 비진도 해송숲
10 배양 마을숲
11 통영 매물도와 해송숲
12 예천 금당실 송림
13 장항 송림
14 삽시도 해송숲
15 마곡사 백범길 소나무숲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1장. 진안의 마을숲
01 아름다운 마을숲 1번지 하초 마을숲
02 은천 마을숲과 거북이야기
03 원연장 마을숲과 마을숲 축제
04 원반월 마을숲과 마이산
05 영모정숲 이야기
06 백운 원반송과 내동마을
07 원가람 마을숲과 상수리
08 원두남·삼봉·원월평 마을숲
09 안정동 마을숲
10 염북 마을숲
11 판치·신동 마을숲
12 윤기 마을숲과 주변 마을의 모정
13 술풀
14 원동촌 마을숲
15 무거 마을숲
16 하향 마을숲
17 탄곡 마을숲
18 내오천 마을숲
19 마령초등학교 이팝나무숲
20 원단양 마을숲
21 원좌산 마을숲
22 원외궁·상외궁 마을숲
2장. 장수의 마을숲
01 양신 마을숲과 새마을운동
02 난평마을 소나무숲과 알봉 전설
03 노하 마을숲과 추억
04 원삼장 마을숲
05 월강마을 깔봉숲과 초장 마을숲
06 용계 마을숲과 장풍비보
07 원명덕·평지 마을숲
08 동촌 마을숲
09 마평 마을숲
10 동고 마을숲
11 구선동 마을숲과 돌석상
12 원송천 마을숲
13 연동마을 솔숲
3장. 임실의 마을숲
01 방동 마을숲과 방수 8경
02 물우리 마을숲
03 구담 마을숲
04 수월 마을숲
05 금평 마을숲
06 필봉 마을숲
07 양지·낙촌 마을숲
4장. 무주의 마을숲
01 왕정 마을숲과 반딧불 축제
02 주고·당저 마을숲과 동산숲
03 통안 마을숲
04 명천 마을숲
05 죽장 마을숲
5장. 완주·전주의 마을숲
01 완주 두방 마을숲과 소유권
02 완주 봉동·고산 마을숲
03 완주 화원 마을숲
04 완주 마자 마을숲
05 완주 내아 마을숲
06 전주 건지산과 용수동 왕버들
07 전주고등학교 학교숲
6장. 남원·순창·정읍·부안·고창의 마을숲
01 남원 왈길·옥전·계산 마을숲
02 남원 사곡 마을숲과 대말 방죽숲
03 남원 운봉 선두숲
04 남원 신기 마을숲
05 남원 내인 마을숲
06 순창 팔왕 마을숲과 담양 관방제림
07 정읍 공동 마을숲
08 부안 내소사 전나무숲
09 고창 삼태 마을숲
7장. 전국의 마을숲
01 금오도 해송숲과 봉산
02 해남 녹우당 해송숲
03 영광 법성진 숲쟁이
04 해남 서림
05 남해 마을숲과 마을숲 보존
06 하동 송림
07 고성 장산 마을숲
08 함양 도천 마을숲
09 통영 비진도 해송숲
10 배양 마을숲
11 통영 매물도와 해송숲
12 예천 금당실 송림
13 장항 송림
14 삽시도 해송숲
15 마곡사 백범길 소나무숲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