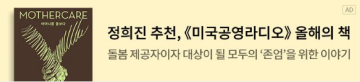어떤 죽음에도 당신의 책임은 있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작은 실천
$19.44
SKU
9788962632538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05/2 - Thu 05/8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04/29 - Thu 05/1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23/06/26 |
| Pages/Weight/Size | 148*217*20mm |
| ISBN | 978896263253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Description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가
이 책을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단어는 ‘지속가능성’이다. 지속가능성이란 말을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것이다. 그만큼 지구에 거주하는 인간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다. 요즘 ‘기후 변화’란 단어가 ‘기후 위기’로 바뀌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렇게 끊임없이 기후 변화라는 단어를 들음에도 여전히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다. 왜 그럴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큰 문제이고 슬픈 일이다. 하지만 내가 바로 문제의 일부고, 나는 음악을 연주하면서 로마가 불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이 나서야 한다.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다. 명확한 생각과 메시지다. 전문 용어만큼 감정적 언어를 잘 구사해야 한다. 나무를 껴안는 사람들(환경보호론자, 일명 외코)은 감정을 구조화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콩알 세는 자들(경제학자)은 감정의 모호함과 막연함에 대한 반감을 극복해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은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확신할 때에만 자기 본연의 과제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제란 기후 변화를 줄이거나 돌이키는 것, 세계의 생태계를 지켜나감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는 공동으로 연대해 함께할 때에만 우리 스스로와 세계를 구원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함께 실패할 수밖에 없다.
책의 서두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모 패스트푸드 체인은 햄버거를 팔아 하루에 24명을 죽음으로 내몬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햄버거가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어서가 아니라 육류 생산이 장기적으로 초래하는 생태학적 결과와 관련한 죽음이라는 것이다. 죽음을 생각하는 걸 마뜩잖아 하다 보니 킬 스코어(Kill Score: 우리말로 옮기면 ‘살인 지수’나 ‘살인 점수’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 우선 거부감을 느끼고 주저하는 마음이 든다. 누가 그런 걸 생각하고 싶겠는가? 하지만 킬 스코어가 식은 죽 먹기처럼 들리지 않더라도 이를 피해갈 수는 없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겠지만, ‘자연적’ 죽음과 ‘때 이른’ 죽음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한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비슷비슷 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불행하다.’ 이와 비슷하게 자연적 죽음은 모두 비슷하지만, 때 이른 죽음은 그렇지 않다.”
이런 문장은 우리가 정말로 킬 스코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게 할지도 모른다. 때 이른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이와 관련한 범죄 현장을 세세하게 점검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다 보면 그 현장에서 우리 자신의 발자국도 발견할 것이기에.
이 책을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단어는 ‘지속가능성’이다. 지속가능성이란 말을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것이다. 그만큼 지구에 거주하는 인간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다. 요즘 ‘기후 변화’란 단어가 ‘기후 위기’로 바뀌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렇게 끊임없이 기후 변화라는 단어를 들음에도 여전히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다. 왜 그럴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큰 문제이고 슬픈 일이다. 하지만 내가 바로 문제의 일부고, 나는 음악을 연주하면서 로마가 불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이 나서야 한다.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다. 명확한 생각과 메시지다. 전문 용어만큼 감정적 언어를 잘 구사해야 한다. 나무를 껴안는 사람들(환경보호론자, 일명 외코)은 감정을 구조화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콩알 세는 자들(경제학자)은 감정의 모호함과 막연함에 대한 반감을 극복해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은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확신할 때에만 자기 본연의 과제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제란 기후 변화를 줄이거나 돌이키는 것, 세계의 생태계를 지켜나감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는 공동으로 연대해 함께할 때에만 우리 스스로와 세계를 구원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함께 실패할 수밖에 없다.
책의 서두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모 패스트푸드 체인은 햄버거를 팔아 하루에 24명을 죽음으로 내몬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햄버거가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어서가 아니라 육류 생산이 장기적으로 초래하는 생태학적 결과와 관련한 죽음이라는 것이다. 죽음을 생각하는 걸 마뜩잖아 하다 보니 킬 스코어(Kill Score: 우리말로 옮기면 ‘살인 지수’나 ‘살인 점수’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 우선 거부감을 느끼고 주저하는 마음이 든다. 누가 그런 걸 생각하고 싶겠는가? 하지만 킬 스코어가 식은 죽 먹기처럼 들리지 않더라도 이를 피해갈 수는 없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겠지만, ‘자연적’ 죽음과 ‘때 이른’ 죽음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한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비슷비슷 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불행하다.’ 이와 비슷하게 자연적 죽음은 모두 비슷하지만, 때 이른 죽음은 그렇지 않다.”
이런 문장은 우리가 정말로 킬 스코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게 할지도 모른다. 때 이른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이와 관련한 범죄 현장을 세세하게 점검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다 보면 그 현장에서 우리 자신의 발자국도 발견할 것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