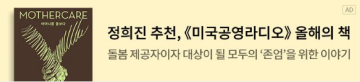보이지 않는 질병의 왕국
만성질환 혹은 이해받지 못하는 병과 함께 산다는 것
$20.52
SKU
9788960519886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Wed 05/14 - Tue 05/20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Fri 05/9 - Tue 05/13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23/07/12 |
| Pages/Weight/Size | 140*220*30mm |
| ISBN | 9788960519886 |
| Categories | 인문 > 인문/교양 |
Description
“19세기의 결핵, 20세기의 암과 에이즈를 잇는
우리 세대의 병은 만성질환이다”
언젠가 우리 모두 겪게 될 아픔에 관한 이야기
오은 시인, 이길보라 감독, 김준혁 의료윤리학자 추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뉴요커] [타임] [보그] 올해의 책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나?’
어느 날 갑자기 삶을 곤경에 빠뜨리는 병이 닥치면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건강도 자기 관리의 하나로 여기는 시대에, 아픈 사람은 실패자인 것만 같다. 게다가 원인도 치료법도 모르는 병, 잠깐 앓고 마는 게 아니라 평생 함께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병에 걸리면, 이로 인해 망가진 자기 인식을 복구하고 아픈 사람으로서의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해진다.
“나는 몸이 불편했지만, 증상이 확실하고 치료법도 정해진 그런 병은 아니었다. (…) 답을 찾지 못한 가운데 심한 절망에 사로잡힌 나는, 내가 겪는 일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만 있다면 건강을 되찾으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마치 자신의 숨겨진 이름을 찾아야 하는 판타지 소설 속 어린아이처럼, 그 이야기를 알아내기만 하면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책은 작가 메건 오로크가 10년 동안 써 내려간 그 ‘이야기’다. 오로크는 20대 초반부터 정체불명의 병에 시달렸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자가면역질환 진단을 받기도 했지만, 약을 먹어도 병은 낫지 않았다. 검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며 도리어 환자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는 의사들을 뒤로하고, 스스로 미스터리의 답을 찾아 나섰다. 면역계의 활동과 의학의 역사에 대해 공부하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온갖 치유법(때로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도)을 시도하고, 의료계 전문가들과 동료 환자들을 만났다. 자신의 고통에 대해 파고들수록 이것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렇게 “예고도 없이 찾아온 자신의 고통에 이름을 붙이기 위한” 지극히 사적인 여정은, 만성질환을 앓는 이들이 처한 현실을 탐색하고 우리 사회의 질병에 대한 인식과 현대 의학의 한계를 짚는 더 넓은 방향으로 뻗어나간다. 오은 시인의 추천사처럼, 아픈 몸으로 사는 일은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당장 죽는 병이 아니어도, 남들 눈에 괜찮아 보여도, 우리는 언제든 아프고 힘들 수 있다. 그 고유한 아픔들 하나하나가 결코 사소하지 않음을, 쉬이 끝나지 않는 아픔을 안고 나아가는 불확실한 삶에 관한 이야기를, 이 책을 곁에 두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한다.
우리 세대의 병은 만성질환이다”
언젠가 우리 모두 겪게 될 아픔에 관한 이야기
오은 시인, 이길보라 감독, 김준혁 의료윤리학자 추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뉴요커] [타임] [보그] 올해의 책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나?’
어느 날 갑자기 삶을 곤경에 빠뜨리는 병이 닥치면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건강도 자기 관리의 하나로 여기는 시대에, 아픈 사람은 실패자인 것만 같다. 게다가 원인도 치료법도 모르는 병, 잠깐 앓고 마는 게 아니라 평생 함께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병에 걸리면, 이로 인해 망가진 자기 인식을 복구하고 아픈 사람으로서의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해진다.
“나는 몸이 불편했지만, 증상이 확실하고 치료법도 정해진 그런 병은 아니었다. (…) 답을 찾지 못한 가운데 심한 절망에 사로잡힌 나는, 내가 겪는 일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만 있다면 건강을 되찾으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마치 자신의 숨겨진 이름을 찾아야 하는 판타지 소설 속 어린아이처럼, 그 이야기를 알아내기만 하면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책은 작가 메건 오로크가 10년 동안 써 내려간 그 ‘이야기’다. 오로크는 20대 초반부터 정체불명의 병에 시달렸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자가면역질환 진단을 받기도 했지만, 약을 먹어도 병은 낫지 않았다. 검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며 도리어 환자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는 의사들을 뒤로하고, 스스로 미스터리의 답을 찾아 나섰다. 면역계의 활동과 의학의 역사에 대해 공부하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온갖 치유법(때로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도)을 시도하고, 의료계 전문가들과 동료 환자들을 만났다. 자신의 고통에 대해 파고들수록 이것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렇게 “예고도 없이 찾아온 자신의 고통에 이름을 붙이기 위한” 지극히 사적인 여정은, 만성질환을 앓는 이들이 처한 현실을 탐색하고 우리 사회의 질병에 대한 인식과 현대 의학의 한계를 짚는 더 넓은 방향으로 뻗어나간다. 오은 시인의 추천사처럼, 아픈 몸으로 사는 일은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당장 죽는 병이 아니어도, 남들 눈에 괜찮아 보여도, 우리는 언제든 아프고 힘들 수 있다. 그 고유한 아픔들 하나하나가 결코 사소하지 않음을, 쉬이 끝나지 않는 아픔을 안고 나아가는 불확실한 삶에 관한 이야기를, 이 책을 곁에 두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한다.
Contents
추천의 말
서문
1부 장애물
1 서서히, 그러다 갑자기
2 자가면역이라는 미스터리
3 의사도 모르는 병
4 내가 나인 척
5 차트 위 숫자에 갇힌 환자들
6 대체 의학을 대하는 자세
7 점점 소용돌이의 바닥으로
8 의사는 여자의 말을 믿지 않는다
9 면역, 그 우아하리만치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계
2부 미스터리
10 은유로서의 자가면역
11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12 웃음 치료
13 의심스러운 단서
14 최악의 순간
15 라임병 광인
16 다시 쓰는 미래
17 남겨진 질문들
3부 치유
18 누구도 섬은 아니다
19 희망의 이유
20 지혜 서사
감사의 말
주
참고 문헌
서문
1부 장애물
1 서서히, 그러다 갑자기
2 자가면역이라는 미스터리
3 의사도 모르는 병
4 내가 나인 척
5 차트 위 숫자에 갇힌 환자들
6 대체 의학을 대하는 자세
7 점점 소용돌이의 바닥으로
8 의사는 여자의 말을 믿지 않는다
9 면역, 그 우아하리만치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계
2부 미스터리
10 은유로서의 자가면역
11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12 웃음 치료
13 의심스러운 단서
14 최악의 순간
15 라임병 광인
16 다시 쓰는 미래
17 남겨진 질문들
3부 치유
18 누구도 섬은 아니다
19 희망의 이유
20 지혜 서사
감사의 말
주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