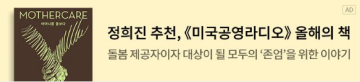이혼해도 될까요?
$9.18
SKU
9788957078471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05/16 - Thu 05/22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05/13 - Thu 05/15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15/04/15 |
| Pages/Weight/Size | 148*210*12mm |
| ISBN | 9788957078471 |
| Categories | 만화/라이트노벨 > 드라마 |
Description
결혼 9년차, 두 아이의 엄마.
남편은 중소기업의 회사원.
얼핏 보기엔 평범하고 평화로운 가정.
하지만…
‘이혼’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날은 없다.
그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 ‘착한 남편’, ‘좋은 가장’이다. 남들이 보는 모습이다. 그런 인식을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는다. 행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니까. 그러다가도 “그래도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말은 통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사람은 오늘 아침 자신이 듣고 짜증 낸 3초의 싫은 소리가 사실은 수십 년 쌓아온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른다. 친구의 이야기… 또는 친구의 친구의 이야기… 어쩌면… ‘내’ 이야기이다.
남편은 중소기업의 회사원.
얼핏 보기엔 평범하고 평화로운 가정.
하지만…
‘이혼’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날은 없다.
그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 ‘착한 남편’, ‘좋은 가장’이다. 남들이 보는 모습이다. 그런 인식을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는다. 행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니까. 그러다가도 “그래도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말은 통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사람은 오늘 아침 자신이 듣고 짜증 낸 3초의 싫은 소리가 사실은 수십 년 쌓아온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른다. 친구의 이야기… 또는 친구의 친구의 이야기… 어쩌면… ‘내’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