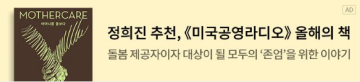나는 나는 새
$14.04
SKU
9788956187259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Wed 05/7 - Tue 05/13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Fri 05/2 - Tue 05/6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16/11/11 |
| Pages/Weight/Size | 210*210*8mm |
| ISBN | 9788956187259 |
| Categories | 유아 > 4-6세 |
Description
새는 정말 훨훨 날 수 있을까요?
깜깜한 세상, 누군가가 답답하다고 외칩니다. 그 깜깜한 세상에 틈이 생깁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안에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 무언가는 또 말해요. “여긴 어디일까? 나는 누구일까?”
아, 새 한 마리. 작고 여리게 생긴 새 한 마리. 그러나 그 새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탐나는 새장에 갇혀 있네요.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갇혀 있을 수만은 없어요. 나는 나는 새니까요. 그 새는 새장 문을 활짝 열고 날아오릅니다. 그런데 또 이건 뭘까요? 이번엔 더 답답한 공간에 갇혔어요. 그래도 새는 날아갑니다. 더 높이, 더 멀리. 하지만 더 단단하고 촘촘한 구조물이 또 새의 앞을 가로막아요. 그래도 새는 또 날아갑니다. 이제 드디어 바다가 보이고 구름이 보여요. 훨훨 나는 새에게 물고기가 말해요. 갈 수 없다고. 숲속 원숭이도 말하죠. 여기가 더 좋다고. 양은 여기가 더 살기 좋다고 새를 꼬드깁니다. 그래도 새는 날아갑니다.
책을 한 장씩 넘기다 보면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정말 새는 자유롭게 날고 있을까?’
다음 장을 넘기면 그제야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새는 자유로운 세상이 아니라 책 속을 날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이 불쌍한 새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답니다. 책을 끝까지 보기만 한다면 말이에요
깜깜한 세상, 누군가가 답답하다고 외칩니다. 그 깜깜한 세상에 틈이 생깁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안에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 무언가는 또 말해요. “여긴 어디일까? 나는 누구일까?”
아, 새 한 마리. 작고 여리게 생긴 새 한 마리. 그러나 그 새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탐나는 새장에 갇혀 있네요.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갇혀 있을 수만은 없어요. 나는 나는 새니까요. 그 새는 새장 문을 활짝 열고 날아오릅니다. 그런데 또 이건 뭘까요? 이번엔 더 답답한 공간에 갇혔어요. 그래도 새는 날아갑니다. 더 높이, 더 멀리. 하지만 더 단단하고 촘촘한 구조물이 또 새의 앞을 가로막아요. 그래도 새는 또 날아갑니다. 이제 드디어 바다가 보이고 구름이 보여요. 훨훨 나는 새에게 물고기가 말해요. 갈 수 없다고. 숲속 원숭이도 말하죠. 여기가 더 좋다고. 양은 여기가 더 살기 좋다고 새를 꼬드깁니다. 그래도 새는 날아갑니다.
책을 한 장씩 넘기다 보면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정말 새는 자유롭게 날고 있을까?’
다음 장을 넘기면 그제야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새는 자유로운 세상이 아니라 책 속을 날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이 불쌍한 새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답니다. 책을 끝까지 보기만 한다면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