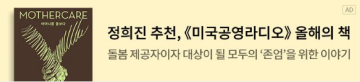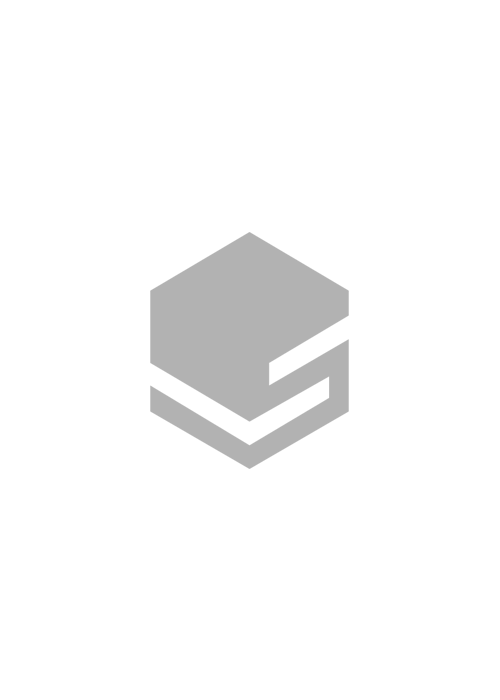Out of Print
회색영혼
$10.45
SKU
9788990379184
본 상품은 품절 / 절판 등의 이유로 유통이 중단되어 주문이 불가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Mon 05/5 - Fri 05/9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Wed 04/30 - Fri 05/2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05/02/05 |
| Pages/Weight/Size | 135*203*20mm |
| ISBN | 9788990379184 |
Description
2003 르노도 상, 2004 ELLE 문학상, LIRE 지 선정 '올해 최고의 책' 등 권위 있는 프랑스 문학상을 석권한 필립 클로델의 역작. ‘성자도 개새끼도 없다. 인간의 영혼, 그것은 누구에게나 어쩔 수 없이 회색이다. 똑같은 회색 진흙이 하얀 대리석 판 위에서는 검게, 검은 대리석 판에서는 희게 보일 뿐이다.’ 필립 클로델은 이와 같은 말로 우리 영혼의 색깔을 회색이라 규정하며 인간 영혼 그 깊은 곳으로 파고든다. 회색은 몹시도 불투명하고 정체도 모호하다. 그렇다면 왜 하필 회색일까? 영혼이란 그냥 그렇게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차라리, 인간 존재의 조건이 어느 정도 ‘죄와 악’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주인공이 집을 비운 사이 난산하던 그의 아내가 아기만 남기고 죽는다. 그는 평생을 죄의식에서 산다. 그가 순백한 영혼의 한 소녀(‘벨 드 주르’)의 의문의 죽음에 집착하는 이유도, 손과 영혼을 혹사하며 글을 쓰는 이유도 모두 죄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 그건 굳이 악의와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통제 불가능한 삶의 우연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좋은 의도와 동정심이 넘치는 단순한 편지 한 장도 무기만큼이나 확실하게 죽음을 부를 수 있다.” 마을에 자원해 온 젊은 여교사는 연인이 전사했다는 편지 한 통에 목을 매단다. 한편, 아델라이드 시페르는 자신이 어린 대녀 ‘벨 드 주르’의 죽음을 멈출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헤어나오지 못한다. “슬픔이 사람을 죽인다. 그리고 죄의식도.” 필립 클로델이 보는 운명과 우연은 그렇게 잔혹하다.
전쟁을 비껴간 마을의 비겁함, 힘 있는 자들의 위선, 한 시대와 그 시대를 산 사람들에 대한 치밀한 묘사, 사랑, 전쟁, 선악, 관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적인 척하는 소설이 판치고, 가벼움과 감각만으로 독자들에게 영합하는 오늘 문학계에 보기 드문 역작이며, 사르트르, 카뮈의 계보를 잇는 프랑스 실존 문학의 정수라는 점이다.
주인공이 집을 비운 사이 난산하던 그의 아내가 아기만 남기고 죽는다. 그는 평생을 죄의식에서 산다. 그가 순백한 영혼의 한 소녀(‘벨 드 주르’)의 의문의 죽음에 집착하는 이유도, 손과 영혼을 혹사하며 글을 쓰는 이유도 모두 죄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 그건 굳이 악의와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통제 불가능한 삶의 우연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좋은 의도와 동정심이 넘치는 단순한 편지 한 장도 무기만큼이나 확실하게 죽음을 부를 수 있다.” 마을에 자원해 온 젊은 여교사는 연인이 전사했다는 편지 한 통에 목을 매단다. 한편, 아델라이드 시페르는 자신이 어린 대녀 ‘벨 드 주르’의 죽음을 멈출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헤어나오지 못한다. “슬픔이 사람을 죽인다. 그리고 죄의식도.” 필립 클로델이 보는 운명과 우연은 그렇게 잔혹하다.
전쟁을 비껴간 마을의 비겁함, 힘 있는 자들의 위선, 한 시대와 그 시대를 산 사람들에 대한 치밀한 묘사, 사랑, 전쟁, 선악, 관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적인 척하는 소설이 판치고, 가벼움과 감각만으로 독자들에게 영합하는 오늘 문학계에 보기 드문 역작이며, 사르트르, 카뮈의 계보를 잇는 프랑스 실존 문학의 정수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