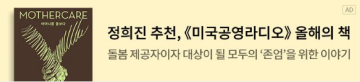약 건네는 마음
처방전에는 없지만 말하고 싶은 이야기
$13.23
SKU
9791192776910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12/13 - Thu 12/19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12/10 - Thu 12/12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23/12/20 |
| Pages/Weight/Size | 115*183*20mm |
| ISBN | 9791192776910 |
| Categories | 에세이 |
Description
“처방전 너머의 아픔을 매만져 보는 일”
건네는 약에 마음을 조금 얹습니다
약사가 마주하는 색색의 알약 같은 순간들
약국을 방문하는 이유는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유쾌한 기분으로 찾아오는 사람은 드물다. 어찌 됐든 약국은 아픔을 떨치기 위해 찾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조금은 어둑한 마음을 가진 채 문을 열어서일까? 그곳에서 우리를 반기는 약사의 이미지가 그다지 밝게 느껴지지 않는 것도 당연할 수 있겠다.
문학수첩의 에세이 시리즈 ‘일하는 사람’의 열네 번째 책 『약 건네는 마음』에서는 어쩌면 흐리게 보였을 수 있는 그래서 쉽게 지나쳤을 법한 약사의 일과 삶을 담았다. 이 책에서 저자는 병원과 약국에서 약사로 일하면서 마주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에게 약을 건네면서 서로 얽힌 마음들에 관해 말한다.
누군가는 “하루 세 번, 식후에 먹어라”는 말의 기억을 안고 약사가 하는 일이 별다를 게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저자가 이야기하는 약사는 기계적인 대답을 하고, 무표정하게 약만 건네면 되는 편한 직업이 아니다. 소아과 개인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에서 일하는 저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속에서 진땀을 흘리고, 약을 빻느라 늘 안구건조증을 앓는다. 또한 약사가 오로지 자신뿐이기에 혼자서 조제실에 약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체크하고 재고를 파악해 주문을 넣는 일도 도맡는다.
그러나 언제나 모든 일이 그렇듯, 역시나 가장 어려운 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약사는 약만큼이나 사람의 눈을 자주 바라보는 직업이다. 그렇기에 그에게는 눈을 마주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렵지만 꼭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된다. 투약대에 발을 턱 올리고는 자신의 증상을 봐달라는 할머니, 엉뚱한 약 이름을 말하며 약을 찾아달라는 손님들,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딸기약’이 들어있지 않으면 약을 먹지 않겠다는 아이까지 말이다.
우리에게 약사는 몸이 아파 경황이 없어서, 약국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서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가는, 회색처럼 무미건조한 사람에 그칠 수 있다. 하지만 저자는 자신의 약국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들고 오는 색색의 알약 같은 사람들”(16p)이라고 말한다. 처방전에 적혀있는 약 이름 너머 기록되지 않은 환자의 아픔을 두드려 보고, 처방된 약에 마음을 조금 얹어서 건네는 약사의 하루하루를 통해 따뜻한 위로와 성찰의 시간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약사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이웃집 세탁소 아주머니는 손님들에게 뽀송한 변화를 선사해 주고, 내가 좋아하는 치킨집의 사장님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위안을 준다. 그리고 이들처럼 약사 역시 세상에 퍼진, 잘못된 약에 대한 선입견들을 고쳐나가야 한다.
(〈매일매일, 희박한 승률의 싸움〉, 35쪽)에서
건네는 약에 마음을 조금 얹습니다
약사가 마주하는 색색의 알약 같은 순간들
약국을 방문하는 이유는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유쾌한 기분으로 찾아오는 사람은 드물다. 어찌 됐든 약국은 아픔을 떨치기 위해 찾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조금은 어둑한 마음을 가진 채 문을 열어서일까? 그곳에서 우리를 반기는 약사의 이미지가 그다지 밝게 느껴지지 않는 것도 당연할 수 있겠다.
문학수첩의 에세이 시리즈 ‘일하는 사람’의 열네 번째 책 『약 건네는 마음』에서는 어쩌면 흐리게 보였을 수 있는 그래서 쉽게 지나쳤을 법한 약사의 일과 삶을 담았다. 이 책에서 저자는 병원과 약국에서 약사로 일하면서 마주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에게 약을 건네면서 서로 얽힌 마음들에 관해 말한다.
누군가는 “하루 세 번, 식후에 먹어라”는 말의 기억을 안고 약사가 하는 일이 별다를 게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저자가 이야기하는 약사는 기계적인 대답을 하고, 무표정하게 약만 건네면 되는 편한 직업이 아니다. 소아과 개인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에서 일하는 저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속에서 진땀을 흘리고, 약을 빻느라 늘 안구건조증을 앓는다. 또한 약사가 오로지 자신뿐이기에 혼자서 조제실에 약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체크하고 재고를 파악해 주문을 넣는 일도 도맡는다.
그러나 언제나 모든 일이 그렇듯, 역시나 가장 어려운 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약사는 약만큼이나 사람의 눈을 자주 바라보는 직업이다. 그렇기에 그에게는 눈을 마주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렵지만 꼭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된다. 투약대에 발을 턱 올리고는 자신의 증상을 봐달라는 할머니, 엉뚱한 약 이름을 말하며 약을 찾아달라는 손님들,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딸기약’이 들어있지 않으면 약을 먹지 않겠다는 아이까지 말이다.
우리에게 약사는 몸이 아파 경황이 없어서, 약국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서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가는, 회색처럼 무미건조한 사람에 그칠 수 있다. 하지만 저자는 자신의 약국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들고 오는 색색의 알약 같은 사람들”(16p)이라고 말한다. 처방전에 적혀있는 약 이름 너머 기록되지 않은 환자의 아픔을 두드려 보고, 처방된 약에 마음을 조금 얹어서 건네는 약사의 하루하루를 통해 따뜻한 위로와 성찰의 시간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약사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이웃집 세탁소 아주머니는 손님들에게 뽀송한 변화를 선사해 주고, 내가 좋아하는 치킨집의 사장님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위안을 준다. 그리고 이들처럼 약사 역시 세상에 퍼진, 잘못된 약에 대한 선입견들을 고쳐나가야 한다.
(〈매일매일, 희박한 승률의 싸움〉, 35쪽)에서
Contents
1장. 약만 지으면 되는 줄 알았지
나의 약국 이야기 … 9
만약 눈이 오지 않았더라면 … 18
매일매일, 희박한 승률의 싸움 … 28
정수리 대신 눈을 … 36
이 약, 드셔보셨나요? … 43
2장. 알약 하나로 이렇게나 우당탕
약사는 약장수가 아니기에 … 53
이름 잘못 말하기 대참사 … 62
속임약효과에 속지 마세요 … 70
가짜들이 너무 많아 … 79
라포르, 믿을 수 있는 … 87
부메랑은 돌아온다 … 95
3장. 이러다 내가 약 먹을 뻔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 … 105
이토록 위험한 알레르기 … 114
바셀린에 얽힌 추억 … 122
‘불량’이라는 글자 … 131
말하지 않아도 아나요 … 139
4장. 약국에도 감초 같은 사람들이 있다
서울남자, 스위트 가이 … 149
사실 다 알고 있거든? … 157
공적 마스크의 비극 … 164
약 공급책 할머니 … 173
우주의 중심에 놓는 … 182
나의 약국 이야기 … 9
만약 눈이 오지 않았더라면 … 18
매일매일, 희박한 승률의 싸움 … 28
정수리 대신 눈을 … 36
이 약, 드셔보셨나요? … 43
2장. 알약 하나로 이렇게나 우당탕
약사는 약장수가 아니기에 … 53
이름 잘못 말하기 대참사 … 62
속임약효과에 속지 마세요 … 70
가짜들이 너무 많아 … 79
라포르, 믿을 수 있는 … 87
부메랑은 돌아온다 … 95
3장. 이러다 내가 약 먹을 뻔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 … 105
이토록 위험한 알레르기 … 114
바셀린에 얽힌 추억 … 122
‘불량’이라는 글자 … 131
말하지 않아도 아나요 … 139
4장. 약국에도 감초 같은 사람들이 있다
서울남자, 스위트 가이 … 149
사실 다 알고 있거든? … 157
공적 마스크의 비극 … 164
약 공급책 할머니 … 173
우주의 중심에 놓는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