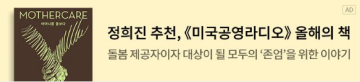바라나시의 새벽
$12.96
SKU
9791191938487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05/31 - Thu 06/6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05/28 - Thu 05/30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23/04/30 |
| Pages/Weight/Size | 128*210*20mm |
| ISBN | 9791191938487 |
| Categories | 소설/시/희곡 > 시/희곡 |
Description
시인의 생각씨앗을 마음밭에 심다
이 시집은 일상에서 드러나는 변화무쌍한 생각을 담담하게 바라보거나 달래기도 하면서 『바라나시의 새벽』에 모두 담았다. 마음이 힘들 때는 시간만한 명약(名藥)이 없다. 그러나 그 명약은 단방처방전으로 구할 수 없다. 바라볼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때로는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을 깨닫게 해준 도반이자 등불은 사람과 봄·여름·가을·겨울이 아낌없이 보여준 생생한 사실이다. 이 시집은 이것들을 흠뻑 받아들이면서 쓴 고마움의 시집이다.
『바라나시의 새벽』은 살아가면서 부딪히면 잠시 비켜 물러서고, 갈등하면서 익어가는 시간을 하나씩 풀어놓은 시집이다. 손가락 하나로 컴퓨터 창을 열면 쓰레그물로 쓸어 담아서 거대한 산이 된 정보들이 우리의 지식을 넘치도록 충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삶은 현실이고 부딪히는 일상은 몸으로 움직여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더 많다. 수만 마리의 정자 중에서 선택된 한 마리의 일생은 어쩌면 도태된 수만 마리의 삶이 응축되어 있다. 제대로 사는 일이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그 만만하지 않은 것을 시인은 「무탈(無?)」에서 조심스럽게 펼쳐 놓는다.
바다의 표면이 잔잔해도 그 속에는 서로 다른 생명체들이 서로 엉킨 듯 더불어 물길을 만들며 때로는 돌아서 흐르는 것을 본다. 나무에 청진기를 갖다 대면 굵은 줄기에는 우리 심장이 건강하게 뛰는 소리가 나고, 옹이가 있는 곳에서는 멈칫 돌아가는 소리가 난다. 사람이 사는 세상도 다르지 않다. 겉모양이 똑같은 사각 상자의 아파트,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사연으로 소설책 한 권은 족히 쓸 분량을 품고 있을 것이다. 흔히 말하는 꽃길도 사람의 다양한 감정과 관계에서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다. 어려운 여건이 앞을 막을 때도 지혜롭게 잘 어우러져서 흘려보내면 탈이 없고,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헝클어진 현실일 뿐이다.
「강이 문을 열다」는 해빙기의 북한강 강가, 물밑 어딘가에서 우렛소리가 부서지듯 달려가면서 사라지는 소리를 난생처음 듣고 깜짝 놀랐다. 시린 빛깔로 겨우내 꽁꽁 얼어 있던 강에 얼음이 녹을 때는 표면은 싸락눈이 내린 것처럼 약간 들뜬 하얀색으로 변하는데 그것은 봄을 부르는 강의 몸짓이었다. 굳은 것과 부드러운 것의 경계선이 허물어질 때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두 큰 진통이 있게 마련이다. 마음에서 벽이 허물어질 때 박하사탕을 먹으면 입안이 시원하고 개운한 향기가 가득한 느낌 그대로였다.
「쿠션언어」 「난 널 이해해」 「다시 쓰다」 「쌓을수록 낮아진다」 「사는 모습이 경전이다」 등은 길들여진 언어의 허상에 갇혀 그것을 진심이라고 믿었던 어리석은 자신을 수없이 헹구면서 마음터가 야물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거기에는 많은 말과 긴 글이 필요하지 않았고 꾸밈없는 마음 씀씀이와 정성 어린 행위가 있을 뿐이다. 복잡하고 다변한 현대의 사람살이라 할지라도 계산보다 더 우선순위에 둘 것은 마음을 바로 쓰고 사는 일이 아닌가. 아버지는 어릴 적에 항상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셨다. 그 습관 덕분에 「새벽달」은 어른이 되어서도 음력 보름날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만나기도 한다. 빛나지 않으면서 눈부신 자태에 넋을 잃고 바라보기도 한다. 사춘기부터 무척 닮고 싶은 인품(?)이기도 했다.
상현달에서 보름달로 차오를 때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젊은 혈기처럼 거침없이 산마루를 오르는 듯 보이지만,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음력 보름을 넘어선 달님은 그냥 그야말로 널널한 푸근함뿐이다. 새벽 달빛은 밤새 어둠을 밝히면서 걸어도 지치지 않고 더 맑아지는 청복(淸福) 그 자체로 다가왔다. 「시월햇살」은 불볕과 태풍의 여름 고개를 힘겹게 넘는 동안 인내하면서 깨달은 자비를 두루 나누면서도 조금도 줄지 않는 마술 같은 따뜻한 마음곳간이었다.
「산이 울다」 「큰오빠」 「딸」 「꽃전」 「봄동꽃이 피기 전」은 끈끈한 정(情)을 만날 수 있다. 지금은 뵐 수 없는 부모님, 너무 엄한 엄마가 싫어서 엄마처럼 살기 싫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징검다리 건너듯 멈칫거리며 냉랭하기도 했다. 흉보면서 닮는다는 말이 있듯이 어느새 다시 돌아와 길들여졌던 언저리에 서성이는 나를 만날 수 있다. 종교를 넘어서는 것이 마음을 잘 쓰고 사는 일이라고 믿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가장 귀하다. 그러나 몸은 정해진 유효 기간이 있는 생물이다. 또한 생각은 하루에도 수없이 싸돌아다닌다. 이 진수성찬의 길 위에서 생각과 몸이 편식으로 길들면 사람 속에서 섬이 되고, 감정에서는 더 외딴섬이 될 것이다. 아주 작은 것에도 꽃비 속을 거닐 듯 행복해하고, 큰 상처에는 의외로 대범해지기도 하고
이 시집은 일상에서 드러나는 변화무쌍한 생각을 담담하게 바라보거나 달래기도 하면서 『바라나시의 새벽』에 모두 담았다. 마음이 힘들 때는 시간만한 명약(名藥)이 없다. 그러나 그 명약은 단방처방전으로 구할 수 없다. 바라볼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때로는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을 깨닫게 해준 도반이자 등불은 사람과 봄·여름·가을·겨울이 아낌없이 보여준 생생한 사실이다. 이 시집은 이것들을 흠뻑 받아들이면서 쓴 고마움의 시집이다.
『바라나시의 새벽』은 살아가면서 부딪히면 잠시 비켜 물러서고, 갈등하면서 익어가는 시간을 하나씩 풀어놓은 시집이다. 손가락 하나로 컴퓨터 창을 열면 쓰레그물로 쓸어 담아서 거대한 산이 된 정보들이 우리의 지식을 넘치도록 충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삶은 현실이고 부딪히는 일상은 몸으로 움직여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더 많다. 수만 마리의 정자 중에서 선택된 한 마리의 일생은 어쩌면 도태된 수만 마리의 삶이 응축되어 있다. 제대로 사는 일이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그 만만하지 않은 것을 시인은 「무탈(無?)」에서 조심스럽게 펼쳐 놓는다.
바다의 표면이 잔잔해도 그 속에는 서로 다른 생명체들이 서로 엉킨 듯 더불어 물길을 만들며 때로는 돌아서 흐르는 것을 본다. 나무에 청진기를 갖다 대면 굵은 줄기에는 우리 심장이 건강하게 뛰는 소리가 나고, 옹이가 있는 곳에서는 멈칫 돌아가는 소리가 난다. 사람이 사는 세상도 다르지 않다. 겉모양이 똑같은 사각 상자의 아파트,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사연으로 소설책 한 권은 족히 쓸 분량을 품고 있을 것이다. 흔히 말하는 꽃길도 사람의 다양한 감정과 관계에서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다. 어려운 여건이 앞을 막을 때도 지혜롭게 잘 어우러져서 흘려보내면 탈이 없고,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헝클어진 현실일 뿐이다.
「강이 문을 열다」는 해빙기의 북한강 강가, 물밑 어딘가에서 우렛소리가 부서지듯 달려가면서 사라지는 소리를 난생처음 듣고 깜짝 놀랐다. 시린 빛깔로 겨우내 꽁꽁 얼어 있던 강에 얼음이 녹을 때는 표면은 싸락눈이 내린 것처럼 약간 들뜬 하얀색으로 변하는데 그것은 봄을 부르는 강의 몸짓이었다. 굳은 것과 부드러운 것의 경계선이 허물어질 때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두 큰 진통이 있게 마련이다. 마음에서 벽이 허물어질 때 박하사탕을 먹으면 입안이 시원하고 개운한 향기가 가득한 느낌 그대로였다.
「쿠션언어」 「난 널 이해해」 「다시 쓰다」 「쌓을수록 낮아진다」 「사는 모습이 경전이다」 등은 길들여진 언어의 허상에 갇혀 그것을 진심이라고 믿었던 어리석은 자신을 수없이 헹구면서 마음터가 야물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거기에는 많은 말과 긴 글이 필요하지 않았고 꾸밈없는 마음 씀씀이와 정성 어린 행위가 있을 뿐이다. 복잡하고 다변한 현대의 사람살이라 할지라도 계산보다 더 우선순위에 둘 것은 마음을 바로 쓰고 사는 일이 아닌가. 아버지는 어릴 적에 항상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셨다. 그 습관 덕분에 「새벽달」은 어른이 되어서도 음력 보름날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만나기도 한다. 빛나지 않으면서 눈부신 자태에 넋을 잃고 바라보기도 한다. 사춘기부터 무척 닮고 싶은 인품(?)이기도 했다.
상현달에서 보름달로 차오를 때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젊은 혈기처럼 거침없이 산마루를 오르는 듯 보이지만,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음력 보름을 넘어선 달님은 그냥 그야말로 널널한 푸근함뿐이다. 새벽 달빛은 밤새 어둠을 밝히면서 걸어도 지치지 않고 더 맑아지는 청복(淸福) 그 자체로 다가왔다. 「시월햇살」은 불볕과 태풍의 여름 고개를 힘겹게 넘는 동안 인내하면서 깨달은 자비를 두루 나누면서도 조금도 줄지 않는 마술 같은 따뜻한 마음곳간이었다.
「산이 울다」 「큰오빠」 「딸」 「꽃전」 「봄동꽃이 피기 전」은 끈끈한 정(情)을 만날 수 있다. 지금은 뵐 수 없는 부모님, 너무 엄한 엄마가 싫어서 엄마처럼 살기 싫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징검다리 건너듯 멈칫거리며 냉랭하기도 했다. 흉보면서 닮는다는 말이 있듯이 어느새 다시 돌아와 길들여졌던 언저리에 서성이는 나를 만날 수 있다. 종교를 넘어서는 것이 마음을 잘 쓰고 사는 일이라고 믿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가장 귀하다. 그러나 몸은 정해진 유효 기간이 있는 생물이다. 또한 생각은 하루에도 수없이 싸돌아다닌다. 이 진수성찬의 길 위에서 생각과 몸이 편식으로 길들면 사람 속에서 섬이 되고, 감정에서는 더 외딴섬이 될 것이다. 아주 작은 것에도 꽃비 속을 거닐 듯 행복해하고, 큰 상처에는 의외로 대범해지기도 하고
Contents
처음
제1부
강이 문을 열다/ 봄마중꽃/ 무탈(無?)/ 산수유나무 꽃문이 열릴 즈음/ 쑥떡/ 삼월에 내리는 눈/ 사월/ 카란을 꿈꾸다-팬데믹에 갇힌 젊음에/ 그냥 가보고 싶었다/ 시간/ 마이 아푸다/ 말빚/ 사람의 길/ 바라나시의 새벽/ 수종사 나한신종꽃의 말/ 고분화엄사 하수구/ 큰길/ 낮달
제2부
쿠션언어/ 쌓을수록 낮아진다/ 낙산사 무료 국수 공양간/ 차를 마시다/ 성전니르바나로 가는 길/ 난 널 이해해/ 봄동꽃이 피기 전에입과 주둥아리/ 사는 모습이 경전이다/ 새벽달/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불이, 코로나19 미뉴에트에 맞추어/ 무지정답/ 폐사지에서/ 부처가 된 느티나무/ 잡초는 위대하다/ 산이 울다/ 염주
제3부
붉은 지심도에서/ 쇠백로/ 고목-500살 된 수종사 은행나무/ 오미자 차입추 전날/ 광장시장 먹자골목/ 구절초/ 말실수/ 아기 방귀/ 가을밤/ 꿈꾸는 불씨/ 갈대가 사는 법/ 겨울 바다에 꽃이 피다-KBS 인간극장, 푸른 바다의 전설/ 외할머니의 수의슬픔/ 다시 쓰다/ 중국 오대산 북대에서/ 오늘은 누구세요?/ 잉걸불/ 눈제
4부
니 맘 내 맘/ 큰오빠/ 열매달/ 시월 햇살/ 가을 연지에서/ 이환이/ 제주도/ 열다섯 살의 달밤/ 내가 졌다/ 딸/ 이웃/ 하얀 저물녘/ 조개구이/ 겨울새들이 날아간다/ 사랑해서 미안해요/ 가벼운 힘/ 엿/ 꽃전/ 길을 걷는다
[인터뷰] 꽃 한 송이 혹은 불교적 세계관
제1부
강이 문을 열다/ 봄마중꽃/ 무탈(無?)/ 산수유나무 꽃문이 열릴 즈음/ 쑥떡/ 삼월에 내리는 눈/ 사월/ 카란을 꿈꾸다-팬데믹에 갇힌 젊음에/ 그냥 가보고 싶었다/ 시간/ 마이 아푸다/ 말빚/ 사람의 길/ 바라나시의 새벽/ 수종사 나한신종꽃의 말/ 고분화엄사 하수구/ 큰길/ 낮달
제2부
쿠션언어/ 쌓을수록 낮아진다/ 낙산사 무료 국수 공양간/ 차를 마시다/ 성전니르바나로 가는 길/ 난 널 이해해/ 봄동꽃이 피기 전에입과 주둥아리/ 사는 모습이 경전이다/ 새벽달/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불이, 코로나19 미뉴에트에 맞추어/ 무지정답/ 폐사지에서/ 부처가 된 느티나무/ 잡초는 위대하다/ 산이 울다/ 염주
제3부
붉은 지심도에서/ 쇠백로/ 고목-500살 된 수종사 은행나무/ 오미자 차입추 전날/ 광장시장 먹자골목/ 구절초/ 말실수/ 아기 방귀/ 가을밤/ 꿈꾸는 불씨/ 갈대가 사는 법/ 겨울 바다에 꽃이 피다-KBS 인간극장, 푸른 바다의 전설/ 외할머니의 수의슬픔/ 다시 쓰다/ 중국 오대산 북대에서/ 오늘은 누구세요?/ 잉걸불/ 눈제
4부
니 맘 내 맘/ 큰오빠/ 열매달/ 시월 햇살/ 가을 연지에서/ 이환이/ 제주도/ 열다섯 살의 달밤/ 내가 졌다/ 딸/ 이웃/ 하얀 저물녘/ 조개구이/ 겨울새들이 날아간다/ 사랑해서 미안해요/ 가벼운 힘/ 엿/ 꽃전/ 길을 걷는다
[인터뷰] 꽃 한 송이 혹은 불교적 세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