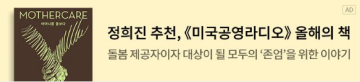내 이름은 춘덕이
$19.32
SKU
9791188167937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12/6 - Thu 12/12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12/3 - Thu 12/5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24/08/05 |
| Pages/Weight/Size | 140*205*20mm |
| ISBN | 9791188167937 |
| Categories | 에세이 |
Description
한 편의 동화 같은 그 시절의 사연들
왜 하필 여자아이 이름을 춘덕이로 지었을까?
나이 오십이 넘어서야 들여다보게 된 엄마의 가슴속
웃다가 울고야 마는 시골소녀의 유쾌한 회상록
전라남도 장성과 광주에서 나고 자란 유춘덕, 오십이 넘은 나이에 자신의 글재주를 발견하고 한편 한편 지은 글을 모아 첫 수필집 『내 이름은 춘덕이』를 출간했다. 어린 시절 엄마와 얽힌 사연을 회상하는 글 모음으로, 들었다 놨다 웃겼다 울렸다 읽는 이의 마음을 움직인다. 글을 쓰면서 오래오래 그토록 부끄러웠던 이름이 오히려 멋져 보였다는 천진한 발상, 치매 초기인 노모의 말이 시(詩)로 들린다는 감성, 어린 시절에 꼬인 감정의 실타래를 이제와 풀어보는 느린 사유와 여유, 그리고 아름다운 문장들과 판소리 같은 전라도 사투리가 수필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왜 하필 여자아이 이름을 춘덕이로 지었을까?
나이 오십이 넘어서야 들여다보게 된 엄마의 가슴속
웃다가 울고야 마는 시골소녀의 유쾌한 회상록
전라남도 장성과 광주에서 나고 자란 유춘덕, 오십이 넘은 나이에 자신의 글재주를 발견하고 한편 한편 지은 글을 모아 첫 수필집 『내 이름은 춘덕이』를 출간했다. 어린 시절 엄마와 얽힌 사연을 회상하는 글 모음으로, 들었다 놨다 웃겼다 울렸다 읽는 이의 마음을 움직인다. 글을 쓰면서 오래오래 그토록 부끄러웠던 이름이 오히려 멋져 보였다는 천진한 발상, 치매 초기인 노모의 말이 시(詩)로 들린다는 감성, 어린 시절에 꼬인 감정의 실타래를 이제와 풀어보는 느린 사유와 여유, 그리고 아름다운 문장들과 판소리 같은 전라도 사투리가 수필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Contents
시작하며
1장 내 이름은 춘덕이
내 이름은 춘덕이
봄날은 온다
청보리밭 길
나는 파라오 공주였다
풀어놓고 키웠다
독한 년
검정 비닐봉지
2장 내가 만난 꿈의 지도
텅 빈 집
망토만 걸쳐도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모르쇠’ 교육법
‘어쩔 뻔했을까요’
내가 만난 꿈의 지도
3장 우리 엄마는 바보다
엄마의 무릎
내 새끼 것은
우리 엄마는 바보다 1
우리 엄마는 바보다 2
부러진 젓가락
여자로서는
우리 엄마는 애간장을 담근다
한숨
4장 어쭈고 산다냐?
어쭈고 산다냐?
그럴 새가 어딨다냐?
기언이 한번은
미선이, 그 가시내가
나랑 결혼 안 했으믄 지금도
눈색이 꽃
그런 사람 어디에 있을까
5장 내 머릿속의 지우개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졌다
내 머릿속의 지우개
내 팔자가 상팔자
오래 살아서 미안해
가지가 뭐시 그리
인자는 괜찮응께
6장 엄마가 웃었다
엄마가 웃었다
몰라서 좋았다
크게 될 놈
우리 집 마당에는
그 무마저도
나는 니가 제일
엄마의 봄
추천사 - 박형동
1장 내 이름은 춘덕이
내 이름은 춘덕이
봄날은 온다
청보리밭 길
나는 파라오 공주였다
풀어놓고 키웠다
독한 년
검정 비닐봉지
2장 내가 만난 꿈의 지도
텅 빈 집
망토만 걸쳐도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모르쇠’ 교육법
‘어쩔 뻔했을까요’
내가 만난 꿈의 지도
3장 우리 엄마는 바보다
엄마의 무릎
내 새끼 것은
우리 엄마는 바보다 1
우리 엄마는 바보다 2
부러진 젓가락
여자로서는
우리 엄마는 애간장을 담근다
한숨
4장 어쭈고 산다냐?
어쭈고 산다냐?
그럴 새가 어딨다냐?
기언이 한번은
미선이, 그 가시내가
나랑 결혼 안 했으믄 지금도
눈색이 꽃
그런 사람 어디에 있을까
5장 내 머릿속의 지우개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졌다
내 머릿속의 지우개
내 팔자가 상팔자
오래 살아서 미안해
가지가 뭐시 그리
인자는 괜찮응께
6장 엄마가 웃었다
엄마가 웃었다
몰라서 좋았다
크게 될 놈
우리 집 마당에는
그 무마저도
나는 니가 제일
엄마의 봄
추천사 - 박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