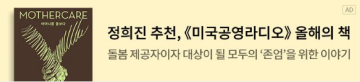사익론
사익이 세상을 발전시킨다
$10.35
SKU
9791186061145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Wed 12/11 - Tue 12/17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Fri 12/6 - Tue 12/10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15/03/25 |
| Pages/Weight/Size | 152*225*20mm |
| ISBN | 9791186061145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제 |
Description
‘사익’이란 단어가 주는 이미지
보통 사람들은 ‘사익’이란 말을 들으면 무엇이 생각날까? 대부분 비슷한 이미지가 떠오를 것이다. 사악한 이기주의, 남들을 배려하지 않는 탐욕, 돈에만 집착하는 구두쇠 등이다. 구체적인 이미지라고 하면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이나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 가깝게는 놀부 등이 적당할 것 같다.
전통적으로 동서양의 수많은 종교나 철학, 문학 등에서 ‘사익’은 금기시되었다. 실상 ‘사익 추구’야말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 본성임에도 말이다. 플라톤, 맹자, 부처 등 초기의 현자들은 그런 본성을 억눌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시에는 타당한 생각이었을지도 모른다. 익명성이 존재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체 사회에서(즉, 서로가 서로를 뻔히 아는 사회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자칫 공동체의 존재 기반을 무너뜨렸을지도 모른다. 사익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강조하는 미덕이 더 강조되었을 것이며, 특히 지도자들에겐 이런 덕목이 더 요구되었을 것이다.
‘사익’의 가치가 발견되다
본능을 억눌러야 하는 규범 속에서 살다 보니 고대, 중세 사회의 인간들은 결코 자유롭지 않았다. 자유로운 인간이 태어날 환경이 아니다 보니 사회의 발전도 지지부진했다. 신분제는 사라지지 않았고 전쟁은 멈추지 않았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18세기가 되어서야 드디어 세계는 제대로 확장되기 시작하였고 인간들은 처음으로 ‘익명성’이라는 문제에 부딪혔다. 그때서야 올바른 사익의 가치가 발견되었다.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에 의해서였다. 그는 ‘정당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익마저 충족시키게 된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나는 공익을 추구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사익은 물론 공익마저 해칠 우려가 많다는 점을 간파한 것이다.
이 책 『사익론』은 왜 우리가 사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인지, 사익 추구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사익과 공익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 것인지 등 우리가 흔히 갖는 사익에 대한 질문에 답을 던져 준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을 갖는 것도, 방법만 정당하다면 얼마든지 사회에 공헌하는 길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좀 더 자기 본성을 긍정하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사익 추구’에 당당할 때
경제학을 처음 배울 때 듣는 명제 중 하나는 “인간의 욕심은 무한한데, 재화가 한정되어 있으니 희소성 문제가 생긴다.”이다. 이 말 속에는 인간의 사익을 긍정하는 마음이 숨어 있다. 즉, 인간의 본성은 스스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무소유의 미덕을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무리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다. 무소유의 미덕을 베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하라.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미덕을 강조할 수는 없다.
게다가 무소유 같은 것은 이제 미덕도 아니다. 현대사회는 사익의 추구를 정당화하는 쪽으로 진화화고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그 방법만 정당하다면 이제 사익을 추구해도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무소유의 미덕 같은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이 책을 쓴 저자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보통 사람들은 ‘사익’이란 말을 들으면 무엇이 생각날까? 대부분 비슷한 이미지가 떠오를 것이다. 사악한 이기주의, 남들을 배려하지 않는 탐욕, 돈에만 집착하는 구두쇠 등이다. 구체적인 이미지라고 하면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이나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 가깝게는 놀부 등이 적당할 것 같다.
전통적으로 동서양의 수많은 종교나 철학, 문학 등에서 ‘사익’은 금기시되었다. 실상 ‘사익 추구’야말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 본성임에도 말이다. 플라톤, 맹자, 부처 등 초기의 현자들은 그런 본성을 억눌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시에는 타당한 생각이었을지도 모른다. 익명성이 존재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체 사회에서(즉, 서로가 서로를 뻔히 아는 사회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자칫 공동체의 존재 기반을 무너뜨렸을지도 모른다. 사익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강조하는 미덕이 더 강조되었을 것이며, 특히 지도자들에겐 이런 덕목이 더 요구되었을 것이다.
‘사익’의 가치가 발견되다
본능을 억눌러야 하는 규범 속에서 살다 보니 고대, 중세 사회의 인간들은 결코 자유롭지 않았다. 자유로운 인간이 태어날 환경이 아니다 보니 사회의 발전도 지지부진했다. 신분제는 사라지지 않았고 전쟁은 멈추지 않았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18세기가 되어서야 드디어 세계는 제대로 확장되기 시작하였고 인간들은 처음으로 ‘익명성’이라는 문제에 부딪혔다. 그때서야 올바른 사익의 가치가 발견되었다.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에 의해서였다. 그는 ‘정당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익마저 충족시키게 된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나는 공익을 추구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사익은 물론 공익마저 해칠 우려가 많다는 점을 간파한 것이다.
이 책 『사익론』은 왜 우리가 사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인지, 사익 추구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사익과 공익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 것인지 등 우리가 흔히 갖는 사익에 대한 질문에 답을 던져 준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을 갖는 것도, 방법만 정당하다면 얼마든지 사회에 공헌하는 길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좀 더 자기 본성을 긍정하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사익 추구’에 당당할 때
경제학을 처음 배울 때 듣는 명제 중 하나는 “인간의 욕심은 무한한데, 재화가 한정되어 있으니 희소성 문제가 생긴다.”이다. 이 말 속에는 인간의 사익을 긍정하는 마음이 숨어 있다. 즉, 인간의 본성은 스스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무소유의 미덕을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무리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다. 무소유의 미덕을 베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하라.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미덕을 강조할 수는 없다.
게다가 무소유 같은 것은 이제 미덕도 아니다. 현대사회는 사익의 추구를 정당화하는 쪽으로 진화화고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그 방법만 정당하다면 이제 사익을 추구해도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무소유의 미덕 같은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이 책을 쓴 저자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Contents
엮는 글; 우리에게 ‘사익’은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 - 현진권
‘사익 추구’는 아름답다 - 신중섭
사익 추구의 경제적 의미 - 권혁철
시장의 사익은 허하고 정치의 사익은 금해야 - 정기화
사익 추구를 길들이는 것은 자유시장 - 민경국
사익 없이는 ‘공익’도 없다 - 김행범
사익 추구와 공익 실현 - 황수연
이타주의와 사익 추구는 모순인가? - 김승욱
‘사익 추구’는 아름답다 - 신중섭
사익 추구의 경제적 의미 - 권혁철
시장의 사익은 허하고 정치의 사익은 금해야 - 정기화
사익 추구를 길들이는 것은 자유시장 - 민경국
사익 없이는 ‘공익’도 없다 - 김행범
사익 추구와 공익 실현 - 황수연
이타주의와 사익 추구는 모순인가? - 김승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