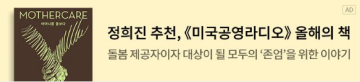저녁이라는 말들
$16.20
SKU
9791168150829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Mon 02/3 - Fri 02/7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Wed 01/29 - Fri 01/31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24/06/27 |
| Pages/Weight/Size | 128*188*20mm |
| ISBN | 9791168150829 |
| Categories | 소설/시/희곡 > 시/희곡 |
Description
김육수의 첫 시집 『저녁이라는 말들』을 어느 규격에 넣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양한 시편들이 전개되면서, 공통적인 건 단순소박미와 낭만적인 방랑자의 면모를 향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소박한 심상들은 낭만적인 정조와 밤하늘의 별을 사랑하는 방랑자의 여정이 쓸쓸하지만, 자신을 찾아가는 시인의 길일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을 것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탐험은 소소하게 펼쳐지는 부분도 있으나 ‘소박한 것은 위대하다’라는 것을 증명한 시인 프랑시스 잠을 생각하면 미소가 나온다.
김육수는 외롭고 쓸쓸한 발걸음의 방랑자로서 혼자만의 아득한 공간에 주목한다. 그 공간에서 대상들을 호출함으로써 그가 부르는 노래와 함께, 공간은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다. 그리하여 노래는 진경眞境에 도달하여 무정물과 유정물이 상호교감하면서 전통적인 서정시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김육수의 슬프면서도 마음을 상하지는 않는 중용적인 시적 태도를 견인함으로써, 서정의 심상으로 쓸쓸함과 고독에서, 오히려 시의 감흥은 점층적으로 고조된다. 더 많은 시편들을 얘기하고 싶지만, 나머지는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두는 게 마땅하다. 일취월장日就月將할 김육수의 시를 생각하며, 또 다른 방랑자로 만날 그를 생각하며, 다음 시집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육수는 외롭고 쓸쓸한 발걸음의 방랑자로서 혼자만의 아득한 공간에 주목한다. 그 공간에서 대상들을 호출함으로써 그가 부르는 노래와 함께, 공간은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다. 그리하여 노래는 진경眞境에 도달하여 무정물과 유정물이 상호교감하면서 전통적인 서정시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김육수의 슬프면서도 마음을 상하지는 않는 중용적인 시적 태도를 견인함으로써, 서정의 심상으로 쓸쓸함과 고독에서, 오히려 시의 감흥은 점층적으로 고조된다. 더 많은 시편들을 얘기하고 싶지만, 나머지는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두는 게 마땅하다. 일취월장日就月將할 김육수의 시를 생각하며, 또 다른 방랑자로 만날 그를 생각하며, 다음 시집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Contents
1부
나를 찾아서·12
새벽길·13
상처의 길·14
행복·15
오일장·16
동태·18
중앙시장·19
햇살 비치다·20
귀가·22
걸어온 길·23
나팔꽃·24
도시의 일상·25
아침 숲속 길·26
2부
동해, 골목길·28
콩나물국밥집·30
저무는 하루·31
언덕을 오르다·32
부둣가 선술집·33
막차·34
떠나는 길·35
강가에서·36
안개·37
지난날·38
채무자·39
시간의 길목·40
3부
포장마차·42
지금은·43
인력시장·44
우리 건어물 공장에는·45
시작·46
부둣가·47
서울행·48
방랑자·50
두 나무·51
돌고 도는 길·52
나만의 기억방식·53
거미 氏·54
간이포차·55
비상구·56
4부
길을 묻는다·58
떡장수 할매·59
여로 다방·60
나약한 힘·61
경계·62
경포호·63
수산시장 회 센터·64
연인과 자전거·65
오래된 집·66
이별·67
촛불·68
한여름 도로·69
5부
동해, 겨울바다·72
안쪽의 분위기·73
바닷가를 걷는다·74
간난이 할아버지·75
화진포호수에서·76
오늘의 운세·77
오월에·78
숯불구이·80
가을 그림자·81
안목항·82
그늘진 기억·83
수평선·84
저녁이라는 말들·86
해설 | 김영탁_일상의 서정과 방랑자의 시세계·88
나를 찾아서·12
새벽길·13
상처의 길·14
행복·15
오일장·16
동태·18
중앙시장·19
햇살 비치다·20
귀가·22
걸어온 길·23
나팔꽃·24
도시의 일상·25
아침 숲속 길·26
2부
동해, 골목길·28
콩나물국밥집·30
저무는 하루·31
언덕을 오르다·32
부둣가 선술집·33
막차·34
떠나는 길·35
강가에서·36
안개·37
지난날·38
채무자·39
시간의 길목·40
3부
포장마차·42
지금은·43
인력시장·44
우리 건어물 공장에는·45
시작·46
부둣가·47
서울행·48
방랑자·50
두 나무·51
돌고 도는 길·52
나만의 기억방식·53
거미 氏·54
간이포차·55
비상구·56
4부
길을 묻는다·58
떡장수 할매·59
여로 다방·60
나약한 힘·61
경계·62
경포호·63
수산시장 회 센터·64
연인과 자전거·65
오래된 집·66
이별·67
촛불·68
한여름 도로·69
5부
동해, 겨울바다·72
안쪽의 분위기·73
바닷가를 걷는다·74
간난이 할아버지·75
화진포호수에서·76
오늘의 운세·77
오월에·78
숯불구이·80
가을 그림자·81
안목항·82
그늘진 기억·83
수평선·84
저녁이라는 말들·86
해설 | 김영탁_일상의 서정과 방랑자의 시세계·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