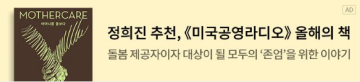절망을 그리다
무너진 자들을 위한 미술의 변명
$27.60
SKU
9791166841385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12/6 - Thu 12/12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12/3 - Thu 12/5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23/01/10 |
| Pages/Weight/Size | 140*220*20mm |
| ISBN | 979116684138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바이마르 시대, 전쟁의 패배가 불러온 고통을 없애기 위해 다시금 전쟁을 준비하는 국가폭력 앞에서 사람들은 조용했다. 그들을 대신한 시대의 선봉은 ‘작가’였다. 주제는 ‘절망’이었다. 이들은 현실 경험세계에 대한 치밀한 천착으로 표현주의의 시동을 건다. 진실에 매달린 표현주의자들은 붓놀림으로 정치적 함성을 대신한다. 표현은 하염없는 ‘관찰’과 ‘생각’이 끝난 다음의 ‘일’이다.
‘미술로 보는 정치’는 정치연구에서 생소하다. 그러나 ‘보고 기억하며 회상’하는 감각적 인지야말로 정치관계의 이해에 효과적이다. 이 책은 ‘미술정치학’을 통해 정치탐구의 지평을 넓히고, 폭력의 역사 속에서 절망하는 인간들을 살핀다.
‘미술로 보는 정치’는 정치연구에서 생소하다. 그러나 ‘보고 기억하며 회상’하는 감각적 인지야말로 정치관계의 이해에 효과적이다. 이 책은 ‘미술정치학’을 통해 정치탐구의 지평을 넓히고, 폭력의 역사 속에서 절망하는 인간들을 살핀다.
Contents
프롤로그
제1장 미술의 정치성과 미술정치: 인상주의 저물고 표현주의 뜨다
1. 표현의 정치와 권력화: 꾸밈과 드러냄은 어떻게 다른가
2. 공격과 바로 드러내기: 굶주린 야수여, 먹이를 뜯어라
주석
제2장 표현주의의 지속과 변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1. 후기 표현주의의 분화: 진실주의·신즉물주의·마술적 사실주의
2. 바이마르의 미술정치: 국가는 덧없고 사람들은 흔들리는데
주석
제3장 절망의 미술정치: 위로와 변호
1. 매춘(賣春)과 매춘(買春)
2. 자살과 색정 살인
3. 카바레와 살롱
4. 전쟁과 패배
주석
제4장 한국의 표현주의: 미술사상의 번짐과 스밈
1. 국경의 해체와 미술의 힘: 절망은 어디서나 넘쳤다
2. 한국미술과 작가의 표현정치: 미술사는 끊어지지 않는다
주석
에필로그
참고문헌
제1장 미술의 정치성과 미술정치: 인상주의 저물고 표현주의 뜨다
1. 표현의 정치와 권력화: 꾸밈과 드러냄은 어떻게 다른가
2. 공격과 바로 드러내기: 굶주린 야수여, 먹이를 뜯어라
주석
제2장 표현주의의 지속과 변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1. 후기 표현주의의 분화: 진실주의·신즉물주의·마술적 사실주의
2. 바이마르의 미술정치: 국가는 덧없고 사람들은 흔들리는데
주석
제3장 절망의 미술정치: 위로와 변호
1. 매춘(賣春)과 매춘(買春)
2. 자살과 색정 살인
3. 카바레와 살롱
4. 전쟁과 패배
주석
제4장 한국의 표현주의: 미술사상의 번짐과 스밈
1. 국경의 해체와 미술의 힘: 절망은 어디서나 넘쳤다
2. 한국미술과 작가의 표현정치: 미술사는 끊어지지 않는다
주석
에필로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