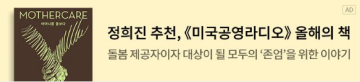조선은 법가의 나라였는가
죄와 벌의 통치공학
$74.75
SKU
9788974182151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Thu 11/14 - Wed 11/20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Mon 11/11 - Wed 11/13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07/04/20 |
| Pages/Weight/Size | 153*224*60mm |
| ISBN | 9788974182151 |
| Categories | 역사 |
Description
'권력의 나라' 조선은 군주를 앞세워 유가의 그늘 속으로 숨어든 힘센 자들의 연출과 기획 속에서 지탱한 왕조였다. 이 책은 권력을 움켜잡거나 움켜잡으려는 이들의 지모와 계략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민중을 정치적으로 이끌려는 자들의 욕망과 의지보다 도리어 이끌려지는 군상들의 불가피한 동기와 그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어떻게 다스렸는가'보다 '왜 따르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에 초점을 맞추어, '위'에서 '아래'로만 바라보던 조선 정치사 이해의 새로운 경로를 탐색한다.
특히 정치적 강자의 지배도구였던 '형벌'을 중심으로 하여, 군주 집권기별 형벌 논의와 집행의 성격을 서로 비교해 보고 그것이 왕조사의 변동 속에서 역사·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주목한다. 아울러 각 군주 집권기간 동안 단행된 처형내역과 사법 쟁송 결과를 압축함으로써 통치공학의 시기별 편차와 변화추이를 뒤쫓는다.
특히 정치적 강자의 지배도구였던 '형벌'을 중심으로 하여, 군주 집권기별 형벌 논의와 집행의 성격을 서로 비교해 보고 그것이 왕조사의 변동 속에서 역사·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주목한다. 아울러 각 군주 집권기간 동안 단행된 처형내역과 사법 쟁송 결과를 압축함으로써 통치공학의 시기별 편차와 변화추이를 뒤쫓는다.
Contents
머리글
1. 왕조국가의 정치적 존속과 법치의 이해
1. 공포의 정치화, 제도폭력의 사회화: 도발ㆍ저항ㆍ역압
2. 율법의 정치성: 정치공학의 안정화
3. 치죄와 자발적 복종의 제도화: 태조-태종
2. 박탈과 제압의 역사: 『조선왕조실록』과 형벌사
1. 범죄와 형벌의 사회사: 조선사의 재구성
2. 외경의 정치적 동원: 세종-성종
3. 권력의 동요와 법치의 변화: 연산-선조
4. 왕권의 강화와 율법의 정치적 합리화: 광해-정조
5. 질서의 문란과 법률의 와해: 순조-순종
3. 법정형과 주변형의 정치적 병용: 오형과 법외형
1. 행형의 역사적 전개
2. 태형ㆍ장형
3. 도형ㆍ유형
4. 사형ㆍ법외형
4. 관용의 통치공학: 구휼과 휼형
1. 용서의 정치학
2. 휼형의 역사적 굴곡
5. 결론: 일탈과 통제의 정치적 순환
참고문헌
색인
1. 왕조국가의 정치적 존속과 법치의 이해
1. 공포의 정치화, 제도폭력의 사회화: 도발ㆍ저항ㆍ역압
2. 율법의 정치성: 정치공학의 안정화
3. 치죄와 자발적 복종의 제도화: 태조-태종
2. 박탈과 제압의 역사: 『조선왕조실록』과 형벌사
1. 범죄와 형벌의 사회사: 조선사의 재구성
2. 외경의 정치적 동원: 세종-성종
3. 권력의 동요와 법치의 변화: 연산-선조
4. 왕권의 강화와 율법의 정치적 합리화: 광해-정조
5. 질서의 문란과 법률의 와해: 순조-순종
3. 법정형과 주변형의 정치적 병용: 오형과 법외형
1. 행형의 역사적 전개
2. 태형ㆍ장형
3. 도형ㆍ유형
4. 사형ㆍ법외형
4. 관용의 통치공학: 구휼과 휼형
1. 용서의 정치학
2. 휼형의 역사적 굴곡
5. 결론: 일탈과 통제의 정치적 순환
참고문헌
색인